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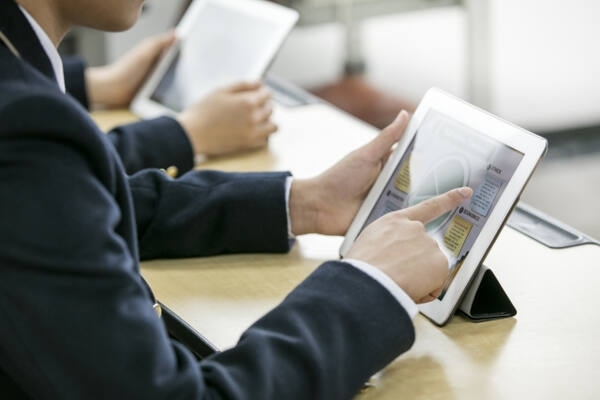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역이 유아기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지역 인재의 정주 기반을 닦는다는 구상이다. 지방 소멸 시대 대응 전략이기도 하다. 지방에서도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인천 강화군 등 31곳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군 등과 강화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까지 마련했다. 캠퍼스형 작은 학교 클러스터 구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생태교육 특화,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시범지역에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무늬만의 특구’로 전락했다. 이를 뒷받침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특화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도 어려워 시설 개선 보조금 사업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은 올해 교육부 보조금 30억원 등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금까지의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 인프라 개선이 이뤄져도 정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교원을 배치하기가 어렵다. 현행법으로는 정해진 학생 규모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고 교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화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유연한 교원 배치가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원을 배정하기 힘든 구조다.
교육발전특구 업무를 밀고 나갈 전담기관도 없다.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의 관련 부서만으로는 정책 일관성도 추진력도 떨어진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발의돼 있다. 특구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 소위원회로 넘어간 후 마냥 표류 중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의 한계를 넘지 못한 교육발전특구다. 인천 강화군 등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으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재 양성 및 정주, 인구 유입까지 꿈꿨을 것이다. 늘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바뀐다. 정치가 바뀌어도 교육발전특구의 당초 취지는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