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GB내 불법, 근절 안되는 진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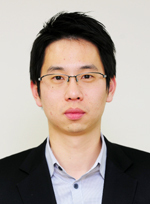
‘그린벨트’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한 개발제한구역.
지난 1971년 급속도로 팽창하는 대도시를 억제해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심 주변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40여 년이 흐른 지금,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규제’의 상징으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주들은 재산권 활용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긴 세월이 흐르면서 그린벨트내에서는 축사나 온실로 허가를 받은 뒤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변경시키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경기도가 집계한 ‘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1971년 그린벨트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 11월까지 도내에서만 총 6만8천678건의 불법시설물이 적발됐다.
지난 2010년 958건, 2011년 991건, 2012년 1천40건 등 매년 1천개 가량의 불법시설물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매년 1천여 건에 달하는 불법시설물이 단속에 적발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밖에 부과할 수 없고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절반가량밖에 징수하지 못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주들에게 접근,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소위 ‘브로커’까지 나타나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시ㆍ군이 불법행위가 자행될 것도,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것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시ㆍ군은 불법행위를 일으킬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고,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일까. A시 공무원의 한마디 말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린벨트내 주민들 지지를 받지 않고 당선되는 시장ㆍ군수가 어디 있나. 또 모든 시설이 허가 받은 데로 축사와 양계시설 등으로 들어서면 악취와 도시미관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솔직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쇼핑몰이나 공장이 들어서는 게 낫다.”
불법이 더 환영받는 그린벨트.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 호 준 정치부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