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말의 현실 감각
우화 한 토막- 어느 부자가 당나귀 한 마리를 몰고 갔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바보들, 한 사람은 타고 가면 좋을 것을 둘이 다 걸어가네”하고 흉을 보는 것이다. 딴은 그럴 법도 하여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자 이번에는 “저런! 어린애는 걷게하고 저 혼자만 호사하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걷고 아들을 태웠더니 “ 나이 어린 것은 타고 나이든 이를 걷게 한다”는 흉이 나왔다. 이도저도 흉잡힌 부자는 둘이 한꺼번에 타고 갔다. 그러자 이번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너무 힘들게 한다며 사람들이 혀를 찼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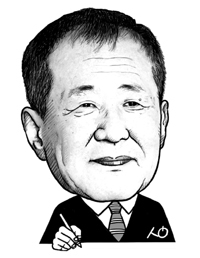
한비자(韓非子) 난삼편(難三扁)에 이런 대목이 있다. 섭(葉)나라 임금 자고(子高)가 정치에 관해 공자(孔子)에게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였다. “정치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해주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해주는 데 있습니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정치를 공자에게 물으니 공자가 답하였다.
“정치는 어진 사람을 골라 쓰는 데 있습니다” 제(齊)나라 경공(景公)이 정치를 공자에게 물으니 공자는 답하였다. “정치는 재물을 절약 하는 데 있습니다” 세 임금이 나가자 제자인 자공(子貢)이 물었다. “세 임금이 선생님에게 정치를 물은 것은 같은 것이었는 데 선생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같지 아니한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공자는 말하였다. “섭나라는 신하의 성읍은 큰데다가 나라의 도읍은 적으니 백성들이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먼데 사람을 따르도록 위로하라고 한 것이다. 노나라 애공에게는 세명의 대신이 있는데 그들은 사방의 선비들을 자기네 임금이 못 만나도록 횡포를 부려 정치는 어진 사람을 골라 쓰는데 있다고 했으며 제나라 경공은 궁전을 세우면서 낭비가 심해 정치란 재물을 절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자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맞춰 정치를 구체적으로 정의 했던 것이다. 즉 언어의 현실 감각 문제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작금 대화나 비난이 본질을 망각한 당나귀 우화와 비슷하다.
임양은 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