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사람의 향기

1997년까지 발행된 이 잡지는 다른 여성지와 사뭇 다른 표지며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여성들의 한복 차림과 전통 밥상, 민중들의 사는 이야기를 그렸지만, 여성지의 차원을 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크게 꾸미지 않은 맑은 얼굴을 한 일반 여성들의 얼굴을 흑백사진 톤으로 표지로 실었던 시기에 이 <샘이 깊은 물>을 구독하면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것이 있었다. 질곡 많은 삶을 산 우리 어르신들의 입말을 그대로 글로 옮긴 자전적 인터뷰였다.
후일 20권으로 엮은 <민중자서전>의 모태가 된 이 코너는 구술자가 사용하는 생사투리 그대로 글로 옮겼다. 충청도 방언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작가 이문구의 소설 <관촌수필>이나 <우리 동네>를 생각나게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구어체였으니 가독성을 따지자면 이문구의 소설보다 이 글이 더 읽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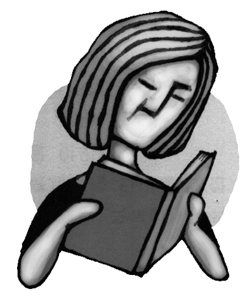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은 말씀하신다. “내 삶을 책으로 쓰면 열권도 넘는다”고. 한 권을 열권으로 과장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말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8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시간의 갈피마다 시기의 장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다. 꼭 성공한 사람, 유명해진 사람, 훌륭한 위인들의 삶만 의미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일을 하고 살았든, 어떤 사회적 성취를 했든 한 사람의 삶에는 고유한 향기가 있다. 이 향기를 잡아 기록하는 건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웃들의 삶을 주목하고 싶다.
전미옥 문화출판그룹 마이스토리 대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