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적자생존! 기록하고 기록하라

이것은 이른바 ‘메모로(Memoro) 운동’인데, 2008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로 퍼져나갔다. ‘기억하다’ ‘일깨우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메모로’에서 온 이 운동을 일본은 2009년 동참했고 우리나라에선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작했다.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온 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일로 후손들은 거기에서 귀중한 역사를 배운다.
한국 일상사 연구의 필독서로 꼽히는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는 아내와 나눈 편지, 매일 꾼 꿈의 기록, 여러 가지 선물 내역 등 일상의 세세한 기록이다. 그 당시에는 개인의 일기로서 가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 역사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기록으로 후대가 그 당시 생활상을 읽을 수 있다. 보통 사람의 일상적 기록은 유용한 역사 연구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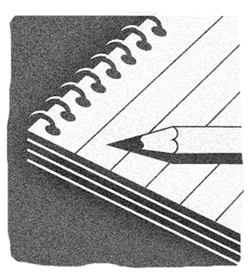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록하는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은 소중하다.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일기든, 가계부든, 일지든 나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보자. 나의 이야기가 우리 후손이 함께 읽는 역사 기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록에 어려움을 겪는 어른들의 삶은 자녀, 혹은 손자손녀가 듣고 기록해드리자.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개인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낼 때 이제껏 잊고 바삐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고 위로와 격려,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삶의 의미가 한결 풍성해지는 것은 훌륭한 덤이다.
전미옥 문화출판그룹 마이스토리 대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