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알파고의 미학 : 기술을 넘어 예술로

2015년 10월 유럽챔피언 판후이 2단과의 대국으로 데뷔한 알파고는 자율학습으로 계속 일취월장해 2016년 3월 이세돌 9단에 이어 최근 커제 9단을 잇달아 꺾었다. 사실 바둑은 구조가 너무 복잡한 데다 창의적인 수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원래 기계가 정복할 수 없다고 알려진 분야라는 점에서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알파고가 거둔 승리는 바둑이라는 인간적인 난관 혹은 한계를 과학기술(AI)의 자율학습으로 단시간에 극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알파고가 바둑을 통해 보여준 수들은 그 창조주 인간에 대해 자신들의 우위성을 과시한 신호라는 점에서 전율할만한 인류사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AI가 인간을 이겼다고 해서 인류가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AI 즉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지능일 뿐이다. 알파고의 멋진 수들은 컴퓨터가 인간의 열등한 두뇌를 지배하기 위해서 냉혹한 공세를 퍼부은 것이라기보다는 인간과 기계가 함께 지적 대화를 나누는 행위(sig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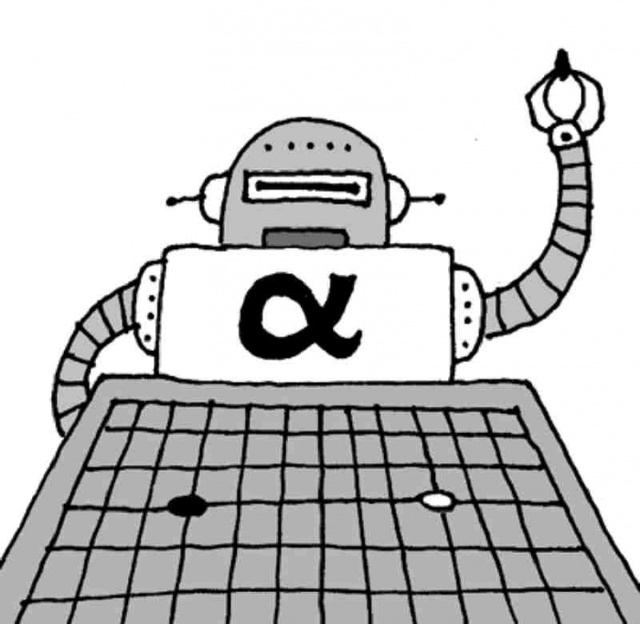
알파고의 훌륭한 수가 있기에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수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알파고와 인간이 서로 연단하면서 공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괴물 같은 실력을 갖춘 알파고도 본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이기에 작업을 지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 인간이 어떻게 알파고와 관계를 맺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애초 알파고의 목적은 바둑계 평정이 아니었다. 이번 대국을 끝으로 바둑 은퇴를 선언한 알파고는 이제 새로운 영역의 출발점, 성과를 토대로 한 범용 AI의 완성으로 수년 내에 여러 지적 영역에서 두루 인간 이상의 실력을 구현하면서 새로운 과학연구의 원동력이 되어 인류사회의 현안들에 대해 큰 돌파구를 열게 될 것이다.
정복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