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문명의 충격과 제국주의의 힘에 휩쓸린 조선민족의 감정에 주목한 ‘식민지 트라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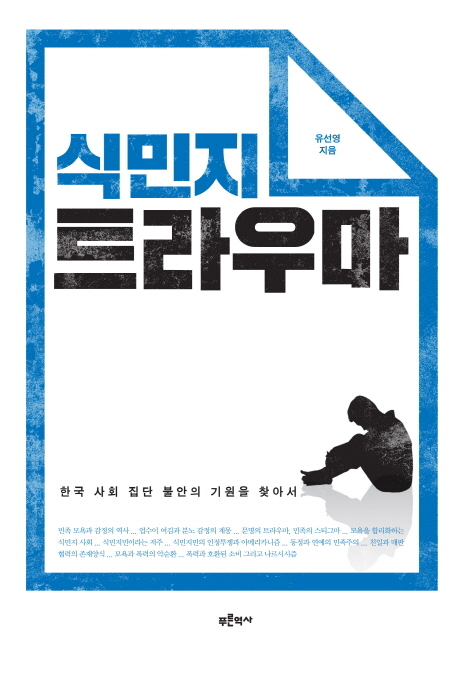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뒤안길로 스러진 이들은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웅과 위인, 살아남은 이들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제도와 조직 같은 유형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예사다. 그러나 이 같은 서술방식, 대상에만 주목해서는 역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미시사나 문화사 등에 눈길을 돌리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것은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
<식민지 트라우마>(푸른역사 刊)를 펴낸 유선영은 우리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일제 식민시기의 역사를 다루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일제의 폭력과 억압 그리고 독립투사와 친일파의 투쟁과 부역에만 주목해서는 식민지의 역사를 온전히 그려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근대 문명의 충격과 제국주의의 힘에 휩쓸린 조선민족, 그 시대를 살아간 식민지민의 ‘감정’에 주목했다. 본질적으로 식민지배의 경험은 트라우마, 외상의 경험으로 바라본다. 이민족에 의한 폭력과 모욕이 반복되는 과정에 자신의 전통과 문화, 정체성이 온통 부정 당하는 정신적 외상을 집단적으로 겪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또 식민화를 문명화라 정당화하는 사태를 맞아 집단 불안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발현됐다고 분석한다. 힘에 대한 열망, 비교에 집착하는 열등감, 히스테리와 공격성, 수치와 죄의식, 나르시시즘의 보상 욕망 등을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증명한다.
여기에서 서구인의 외모에 대한 열패감, 중국인에게 ‘이등신민’으로서 우월감을 과시하는 얼궤이즈, 평양사건에 터져 나온 히스테리컬한 공격성, 속물주의에 가까운 서양문물 숭배 등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식민지 조선인의 민 낯이 드러난다.
저자는 이 민 낯을 기꺼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식민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을 떼자고 제안한다. “탈식민화는 식민지민이 그리고 식민지배의 역사를 겪은 주체들이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제국이 부정하고 스스로 파괴했던, 식민주의의 폭력과 모욕에 의해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인간성을 복원할 때 비로소 완료될 것이다.
근대가 인간에게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성이라는 관념을 창안하고 보편성을 부여한 것이다. 근대는 자기의 인간성을 온전히 전유할 때 비로소 시작될 역사적 시간대이다.”(에필로그 중) 값 2만원
류설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