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어른이 되자

개인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며 그 기준에 맞추라고 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학교를 지배했다. 우리는 그런 학교에서 배웠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며 가슴 터질 듯한 두려움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최루탄 속에서 친구를 잃으며, 스스로 미래를 닫아가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마침내 권력을 되찾아왔다. 본디 우리 것이었으나 늘 우리를 억누르던.
여전히 우리는 정상인과 장애인, 건강(?) 가정과 결손 가정으로 나누어진다. 질병이나 사고로 몸의 일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제대로가 아닌 비정상인가?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혹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결손가정인가? 이런 기준은 많은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하고 불행을 느끼라고 강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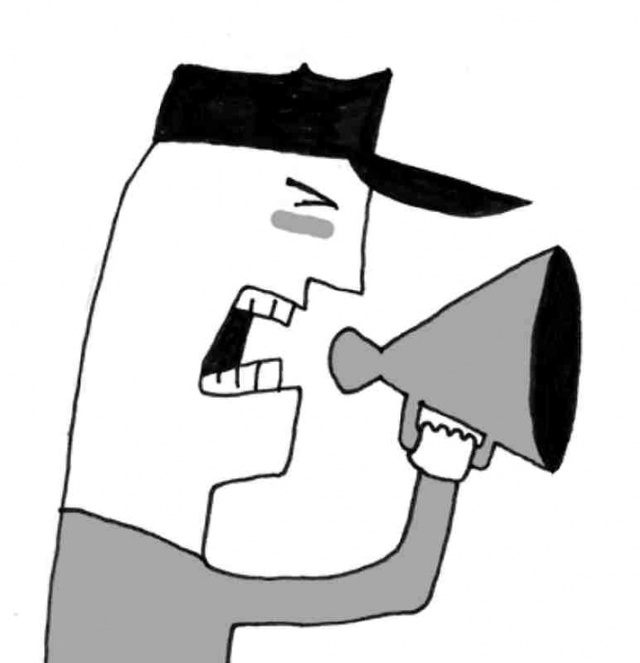
엄마와 둘이 살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 정상(?)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날마다 목격하면서도 ‘결손’이라는 단어를 지우지 않는 무지함이라니! 가정은 구성원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진다.
휠체어를 타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장애를 극복하라고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일어서고 싶지 않거나 노력을 덜 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더 없이 아이를 업고 사랑하는 이와 눈을 맞추고 싶을 것이다. 그들에게 극복하라고 그래서 정상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잔인하거나 무지한 짓이다.
그 상황을 인정하고, 덜 불편하도록 시민과 정부가 배려하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겉모습에 옳고 그름은 없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다. 올해는 어른이 되겠다.
이정미 경기도 보육정책과 연구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