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열쇠는 시민

도시재생의 개념은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먼저 등장했는데, 구도심과 같이 경제·사회·물리적으로 도시의 일부가 쇠퇴했을 때, 해당 지역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도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뉴타운 사업은 특정 지역의 인프라부터 재정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고 사업 주체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의 절차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간단히 말해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뉴타운 사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 토지 등 수요주의 부담이 늘어나 뉴타운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편 토지 등 소유주들이 확실한 주체로 인식되는 뉴타운 사업에 비해 도시재생 사업은 국고와 도비, 시비 등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00억이나 되는 돈을 썼다는데, 도시가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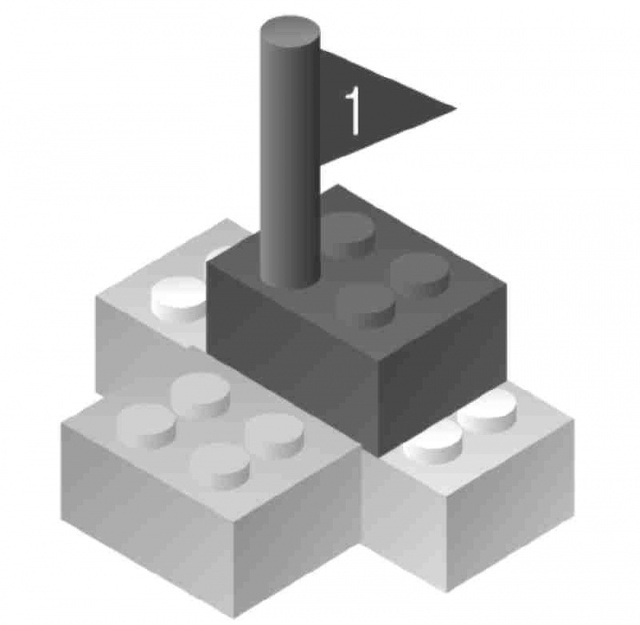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뉴타운 사업의 경우 많은 토지 등 소유주들이 땅을 내놓고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면 사업이 진행되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땅이나 돈을 내놓을 일은 그다지 없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시민들은 방관자이거나 비판자의 입장만 견지하면 될까? 물론 그럴 경우 일부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진행은 되겠지만, 그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만약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이라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시민들이 땅 대신 아이디어를,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할 때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이 보이지 않을까.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