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폭염 단상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의 기세가 심상찮다. 7월 하순에 강화와 통영 등 섬이나 해안가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육지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웃 일본도 사정이 우리보다 낫지 않은 것 같다. 우리와 달리 폭염 특보제가 없는 일본에서는 최고기온이 35도가 넘는 날을 맹서(猛暑)일로 지정하여 고온주의정보를 발표하는데, 전국 총 920여 개소 주요지점 중 240개소 이상이 맹서일이었고, 30도가 넘는 진하(眞夏)일은 700개소 이상 발생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일 모두 전국이 폭염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뜻이겠다.
폭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은 없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5도 높은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하지만 이마저도 각 나라마다 기후나 지리적 위치 등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폭염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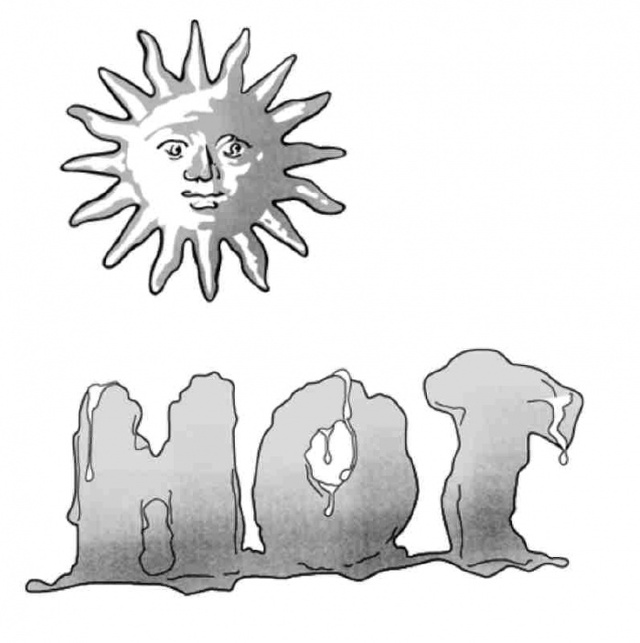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진산사태 등 비(非)기상학적 재해를 제외하고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는(국가별로 연도별로 늘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홍수나 태풍이 아니라 폭염과 가뭄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1994년의 우리나라 폭염 피해로 온열질환자 사망자 수는 3천300명 이상이었고, 2003년 유럽 폭염시에는 약 3만2천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다만, 이는 폭염이 직접적인 사망원인 외에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모두 산입한 것으로서 이 통계를 인용할 경우에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언한다.
폭염은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이다. 폭염경보만으로는 열 관련 사망자수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나 제도가 되지 못한다. 폭염에는 기상청과 언론, 방재, 소방, 보건당국, 사회복지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폭염에 취약한 그룹에 정보를 잘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대피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직된 커뮤니티가 필요하며, 이런 시스템의 효과가 얼마나 확실히 나타나는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미래에 전망되고 있는 폭염 빈발과 강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취약성이 증대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에 대해 정부와 민간사회가 합심하여 체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성균 수도권기상청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