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우리 콩의 자존심과 농업 R&D

책 중에 스테디셀러로 고전 명작을 꼽는다면, 농산물의 스테디셀러는 콩이라고 할 수 있다. 콩은 인류가 농사를 시작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농산물이다. 현대에 이르러 사료, 식량,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콩의 인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콩의 이소플라본(isoflavone)과 콩 발효식품이 성인병을 개선해주는 새로운 기능성 소재로 알려지면서 산업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콩은 생산량도 꾸준히 증대되어 전 세계에서 2016년 기준 3억 톤 이상이 생산됐다.
이 중 1억 톤 이상을 미국이 생산하며 콩 생산대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콩 생산 1위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농업 R&D에서 찾을 수 있다. 미 농무성은 1929∼31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에 원정대를 파견하여 콩 유전자원 4천578점을 수집했다. 수집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기계수확이 가능하고 분지수가 적은 직립형 신품종을 육성하면서 대규모 영농이 가능해져 미국의 콩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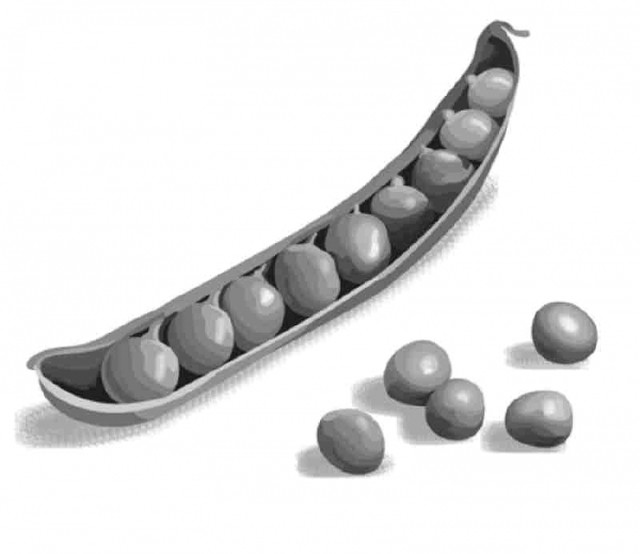
콩의 원산지는 옛 고구려 영역인 만주와 한반도 일대이며, 한반도에서는 신석기시대 말기인 기원전 1천~1천500년경부터 재배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콩은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주요 식량작물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콩을 많이 재배했던 한국, 중국, 일본은 오늘날 오히려 콩의 주요 수입국이 됐다.
우리나라 콩 산업은 열악한 밭작물 생산기반,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이유로 쇠락하고 있다. 국내 콩 생산량은 2013년 154천 톤에서 매년 감소해 작년에는 8만5천 톤까지 감소했다. 콩 수입량은 129만 톤에 이른다. 결국 콩 자급률은 2005년 30.9%에서 2017년 22%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단위면적당 콩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콩의 수입확대로 건강한 푸드플랜과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기계화가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콩 논 재배 확대, 내재해성 및 고기능성 품종 개발 등 콩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 이용과 맞춤형 신품종 육성 등 농업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우리 콩의 자존심을 살리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조창휘 道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