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배움의 즐거움

‘논어’에 나타난 유가적 즐거움은 주로 “배움을 좋아하고[好學]”, “도를 즐거워하는[樂道]”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듯, “위기지학”이란 “위인지학(爲人之學)”과 상대를 이루는 말로, 타인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동기가 아닌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배움을 뜻한다. 이때 배움은 어떠한 수단적 가치를 가지지 아니하며,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공자는 이러한 배움[學]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도(道)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진정한 배움은 단편적인 지식의 축적을 넘어 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의 품격을 고양시키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공자는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논어’에서 즐거움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바로 ‘공안지락(孔顔之樂)’과 ‘여점지락(與點之樂)’일 것이다. 주지하듯, ‘공안지락’은 가난한 형편에 거하면서도 도를 배우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던 안연(淵)의 태도를 칭찬한 공자의 언급에서 유래하며, ‘여점지락’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포부를 묻는 과정에서 증점(曾點)의 답변에 공감을 표한 공자의 언급에서 유래한다. 안연은 진정한 즐거움을 통해 현실적 가난과 불편이 더 이상 그에게 장애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증점은 세상적인 출세를 추구하는 동료들과는 달리 삶을 향한 더 큰 포부와 대장부의 기상을 품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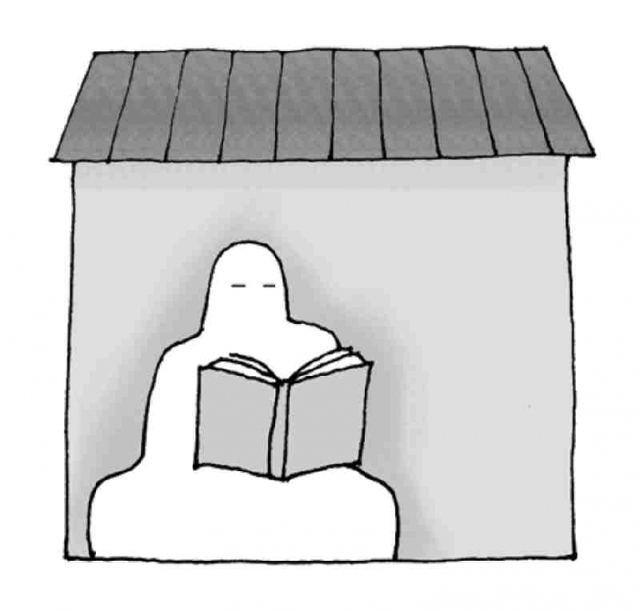
이쯤에서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최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 ‘SKY 캐슬’의 시청자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코웃음을 치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위인지학’이 학문함의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러한 잘못된 배움에 대한 강요가 우리 아이들을 OECD 청소년 자살율 1위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가슴이 답답해진다.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자아발견, 자아실현, 진리에 대한 탐구가 없이 늙어버린다면 이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래서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친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朝聞道, 夕死可矣”)”라고 하였나보다.
임명희 공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