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방분권과 지역통계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전국 시ㆍ군ㆍ구 중 35%에 해당하는 지역이 빠르면 5년 늦어도 30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지방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2015년 마스다 히로야의 책이 번역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 같다.
책 제목이기도 한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출산은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면 인구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은 지방분권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이다.
1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시도별 자료를 보면 서울은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1만명 많았고 경기도는 반대로 전입자가 17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수도권 인구는 늘어났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는 엄연히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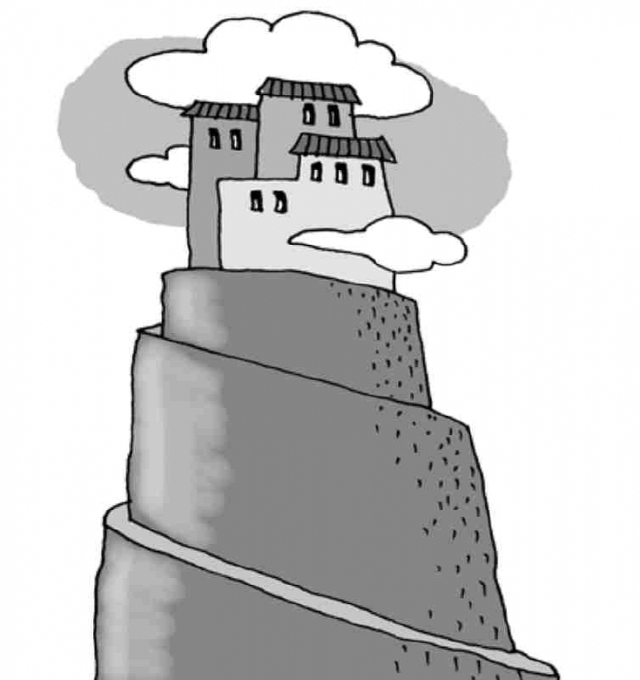
시ㆍ군별 인구이동을 보면 하남시, 화성시, 김포시, 시흥시, 광주시 인구는 눈에 띄게 늘어났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을 보면 수도권에서도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지방소멸의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격차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도로와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듯이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정주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삶의 질과 관련된 정주성의 개선은 편리해진 교통 환경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고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지역통계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66개 기초자치단체가 작성한 지역통계는 총 137종이다. 그 중에서 지역현황을 담은 기본통계 66종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지역특화통계는 71종에 불과하다. 경인지방통계청은 통계컨설팅, 기술지원, 통계교육 등을 통해 지역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지역통계 개발에 매진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통계는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 정확한 통계 신뢰받는 통계 생산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해 본다.
손영태 경인지방통계청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