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어디쯤 있나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성격차지수는 전체 149개국 중 115위였다. 반면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상당히 개선되었기에 세계경제포럼의 115위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비해 너무 낮게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에 유엔개발계획의 10위는 너무 높게 느껴진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는 지수의 산출방식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성격차지수는 말 그대로 성별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수로, 지수를 산출할 때 각국의 절대적인 수치는 반영되지 않고 오직 성별 간의 ‘격차’만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집계가 된다. 성격차지수는 경제참여 및 기회,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교육적 성취의 4개 분야 14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과 생존, 교육적 성취 분야는 상위권 그룹과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반면, 경제참여 및 기회와 정치적 권한의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져 낮은 순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갓 넘었고,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3.9%에 불과한 점(2017년 기준), 기초의원 당선자 여성비율 18.4%,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비율 10.3%,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0% 미만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높은 순위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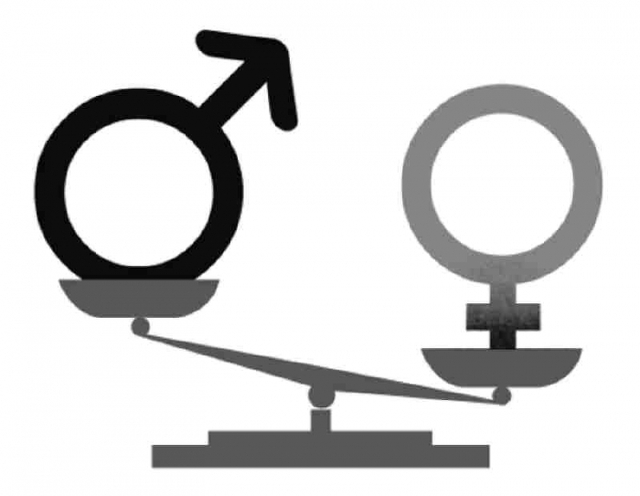
성격차지수의 순위가 낮은 것은 지표 구성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삶의 질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별 간의 격차만을 중심으로 지수를 산출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저개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성별 격차가 존재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성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성불평등지수는 5개의 지표로 이루어지는데 성격차지수와 달리 성별 격차 뿐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도 함께 측정하는 방식이다.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 낮을수록,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수가 많고, 여성의원 비율과 여성의 노동참여가 높을수록 순위는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핵심은 낮은 모성 사망률과 낮은 청소년출산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과 보수적인 사회문화로 인하여 절대값으로 반영되는 이들 두 지표는 비교국들 사이에서도 단연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지수들은 산출방식이 다르고 포함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두 지수에 모두에서 여성의 경제참여와 정치참여에 있어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진 나라는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삶의 많은 부분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는 보다 많은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하겠다.
노경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