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고려청자가 남긴 것들

지난해는 고려건국 1100주년이었다. 국내외에서 고려의 역사문화를 다룬 각종 전시가 열렸고 몇몇은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유물은 단연 고려청자다.
중국에 이어 청자를 만드는 데 성공한 고려는 우수한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12세기에 세계제일의 고려청자를 완성했다. 1123년 고려를 다녀간 북송의 서긍(徐兢)은 견문록인 『선화봉사고려도경』에 ‘고려청자는 색상이 아름다워 고려인들 스스로 비색(翡色)이라고 부른다. … 사자향로 역시 비색인데 가장 정교하다’라는 감상기를 남겼다. 그리고 남송의 수집가 태평노인(太平老人)은 천하의 명품들을 논하는 『수중금』이라는 책에 ‘백자는 중국의 정요백자, 청자는 고려의 비색청자가 천하제일이다’라고 기록했다. 이처럼 고려청자는 당시 고려에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널리 알려져 세계인에게 무한한 동경을 품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 이후 세상이 바뀌고 백자가 유행하면서 잊혀진 고려청자는 500년 뒤 일제강점기에 다시 주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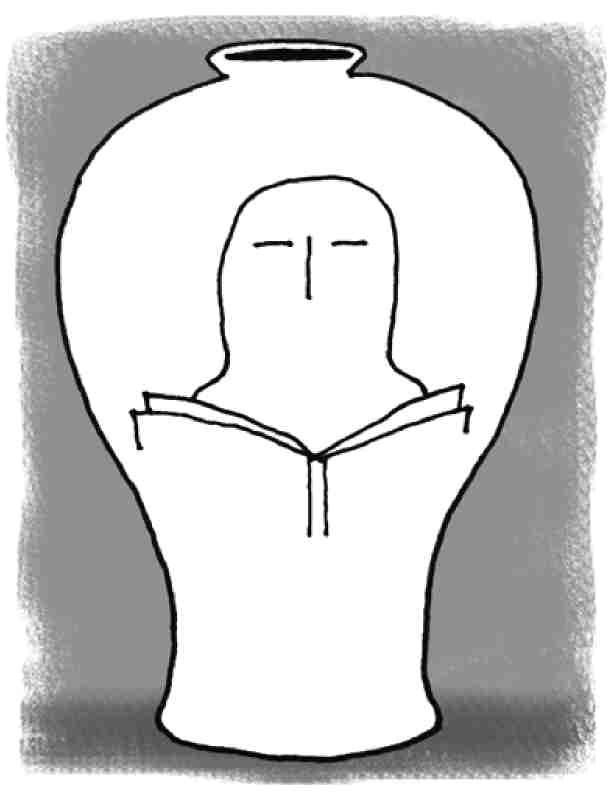
1909년 조선 통감부가 창경궁에 개관한 이왕가박물관을 둘러본 고종황제는 고려청자를 보고 ‘이 청자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요?’하고 물었고, 이토오 통감이 ‘이것은 이 나라의 고려시대 것입니다’하고 설명하니, 고종께서 ‘이런 물건은 이 나라에 없는 거요’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때 이토오는 차마 말을 못 하고 침묵해버렸다고 한다. 그 고려청자는 일제가 수탈을 위해 경의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개성의 고려고분에서 무분별하게 도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워 준 고려청자는 이렇게 다시 세상에 나왔다.
당시 우리나라의 요업은 일제자본에 의한 산업화로 인해 오랜 수공예 전통이 몰락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탈출구가 된 것이 바로 고려청자 수집 열풍에 따른 모조품 생산이었다. 일제강점기 가난했던 우리나라 장인들은 평남 진남포, 개성, 서울 등지에 있던 일본인 요장에서 일을 배우면서도 국경없는 한반도에서 서로 교우하며 고려청자 재현을 위해 함께 노력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우치선, 임사준, 황인춘, 유근형, 김완배 등이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남북한에서 각각 근대 도예의 선구자들로 기억된다.
현재 우치선과 임사준의 후손은 평양의 만수대창작사에서 도예를 한다고 하고 황인춘의 따님 황종례는 경기도 고양에서, 유근형, 김완배의 아드님 유광열 명장과 김종호 명장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서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다. 선대가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후손들이 서로 만나 교우하고 힘을 합쳐 고려청자의 위대함을 다시 보여줄 날이 오기를 바란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부디 모두 건강하시길 빈다.
장기훈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