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붕어빵 축제의 계절

봄이 왔다. 축제의 계절이 시작됐다. 지방자치가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천개가 넘는 관람형 축제와 체험형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축제의 나라’이다. 각 지역들은 축제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연·생태 자원, 특산물, 역사, 예술, 전통문화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축제라는 콘텐츠에 반영시키도 한다. 그러나 축제에 다녀오면 축제의 제목이 다르고 주요 내용이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특별히 무엇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다.
소재가 비슷비슷하고 축제가 대동소이하다. 가수들을 데려와 공연하고, 위생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먹을거리를 팔고, ‘메이드 인 차이나’ 기념품을 팔고, 지역특색과 관련성이 부족한 체험장 시설이 난무한다. 이러니 붕어빵 축제라는 볼멘 소리를 듣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차지하고라도 경제성 또한 너무 떨어진다. 투자 비용이 높은 축제조차도 정작 수익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미비하다. 이래서야 예산 낭비, 시간 낭비, 노력 낭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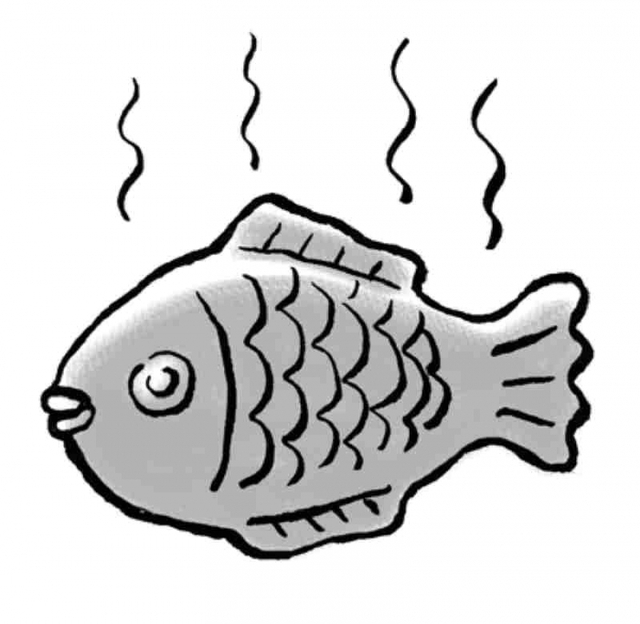
독일 뮌헨에서 매년 열리는 민속축제이자 맥주축제인 ‘옥토버페스트’는 매년 평균 600만명의 관광객들이 모여, 축제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전체 외국 관광객들이 쓰고 간 지출보다 많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인구 43만의 소도시 에딘버러시는 축제에 연 1천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럽의 꽃’으로 탈바꿈 했다.
일본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을 반영한 마츠리 축제가 존재한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기간에는 관광객들이 호텔 잡기도 힘들 정도다.
중국의 하얼빈은 사람들이 생산을 할 수 없을 만큼 건조하고 추운 한겨울에 ‘빙등제’라는 얼음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이 가진 장애요인과 생산성이 없는 비수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광시즌을 창출해내고 있다.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의 창조성과 독창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붕어빵 찍어내는 듯한 축제는 그만두고 다른 축제장에서 즐길 수 없는 킬러 콘텐츠 개발하여 세계적 명품 축제들을 탄생시킬 시점이다. 최소한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감어린 그런 축제를 보고 싶다. 축제는 진화해야 한다.
하수진 열린사회연구소 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