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기술혁신, 만능이 되었으면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을 포함한 새로운 대명사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처음 제기되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 핵심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빅데이터(Big data)의 등장, 네트워크(Network)의 활성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 및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창출에 있다.
기존의 산업혁명들이 인간의 주도 하에 있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산업혁명은 인간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 기술발전은 인간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의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롤(Role) 모델로 평가받는 독일의 경우 2014년부터 ‘Industry 4.0’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신(新)하이테크 전략을 수립하여 스마트형 공장 등 IT기반의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로봇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는 IT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부가가치 및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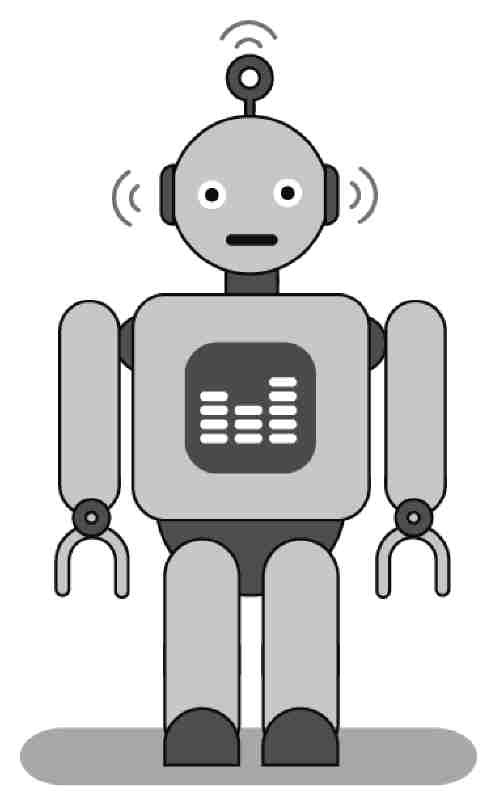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인간의 고유영역인 생존권에 대한 가치는 점차 상실되어가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가치가 기술혁신에 의해 대체됨으로서 편리함을 제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생존권에 대한 가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보고 느끼는 것들은 첨단화 되어갈 것이며, 교통·통신의 발달은 더욱 빠름을 원하게 되겠지만, 앞으로의 환경을 맞이해야 할 세대는 생존권에 있어 더욱 혹독한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류는 3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하면서 기술발달 및 혁신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서 이전되기까지 반세기 정도로 짧아지면서 인간의 생존권에 대한 대응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인간의 생존권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산업혁명이 도래한다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급속한 변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
홍승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