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나의 전전두엽은 건강한가?

정국이 뜨거웠다. 논리보다 감정 대립이 절정을 이루었고, 악성댓글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다. 시대가 흉흉하면 언어도 오염된다. 정조 임금이 ‘홍재전서’에서 “밝은 시대에는 선한 말에 사람이 따르지만 험난한 시대에는 추악한 말에 따른다”고 한 말 그대로다. 그러면 추악한 말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약한 성정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성정에 대한 관심은 동서양 철학은 물론 종교에서도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성리학은 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다. 인간은 천성인 본연지성(本然之性)의 이(理), 즉 ‘인의예지(사단)’를 지닌다. 동시에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기도 하여, 기(氣)가 발현한 ‘희노애락애오욕(칠정)’의 기질지성(氣質之性) 또한 지닌다. 절대 선함이 본연지성이라면,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무쌍한 특성이 기질지성이다.
퇴계 이황은 사단(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즉 불쌍히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양보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은 이가 발한 것이나 기가 그 이를 따르고 있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나 이가 그것을 타고 있다(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 말을 탔다면 말은 기이고 올라 부리는 사람은 이가 되는 셈이다. 동시에 발해야 비로소 움직이고 멋대로 가는 말은 사람이 잘 부려야 한다. 이른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이다. 이기가 상호 작용을 하되 기에 대한 이의 우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선 의지(善意志)와 이성을 확연히 지켜 가려는 철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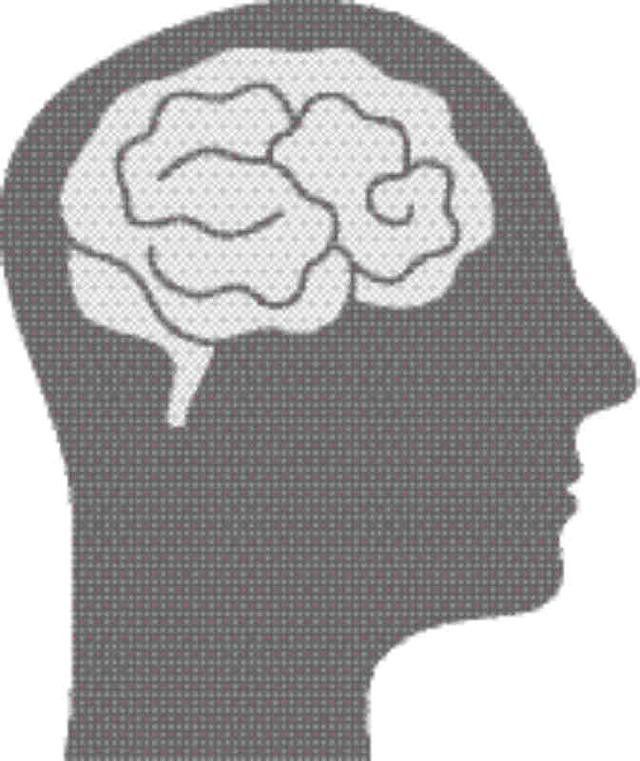
이를 뇌과학에서 살피면 흥미롭다. 김종성 충남대의대 교수는 퇴계 철학과 임상의학을 접목시켜, 이가 마음에서 우세하지 못한 조건일 때 기가 작동하는데 전두엽이 이의 인체학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기질지성이 발현하는 변연계가 발달된 인간이 되지 말고, 본연지성이 발현하는 전두엽이 발달한 인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치료에서도 본성(理)을 되찾는 마음가짐이 치유에 실제 도움이 됨을 밝혔다. 세계적인 뇌 연구학자인 신희섭 박사는 뇌의 기본 작동 동기를 연구한 바 있다. 뇌는 뇌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전전두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쾌락중추가 전권을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적용해보면 사단의 이는 전전두엽의 발달과 작용에서 오고, 바르지 못한 칠정의 기는 전전두엽의 미성장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은 기질지성이 쉽게 발현되기 쉽다. 전전두엽에 터를 잡은 이가 약해지면 인간은 이기적 욕구나 쾌락, 감정적 표현에 더 깊이 빠져든다. 뇌가 부정적 환경에 있으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정형 뇌 세포를 발달시키고 작동한다. 욕을 빈번하게 하면 욕된 인간이 되고, 매사 부정과 비방에 익숙한 인간은 그 자신이 그것에 매몰되어 그러한 삶 속에 갇히게 된다는 이치다. 스마트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자기표현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 그 표현에 나의 전전두엽은 과연 건강한가?
이만식 경동대 온사람교양교육대학장·시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