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경제이슈] 디플레이션의 의미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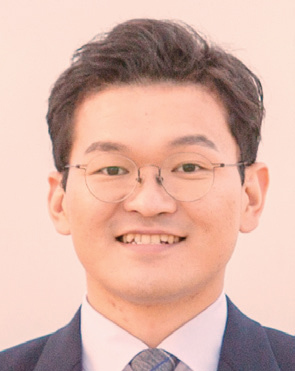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상품ㆍ서비스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지속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하면 디플레이션이라 부른다. 물론 돼지고기나 쌀 등 특정 품목만의 가격하락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과 달리 디플레이션의 경우 주가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액 실질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증가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력은 상승한다. 즉, 같은 상품ㆍ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가진 돈의 명목가치(액면금액)는 변하지 않지만, 돈의 실질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생산자의 경우 상품 가격은 하락하지만, 제품ㆍ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과 임금도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이윤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의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등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촉발됐으며 실제로 디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러한 경기침체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등 공급 측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급감하는 등 수요측면에 따른 것이라면 디플레이션은 대규모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돈의 구매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에 신중해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구매수요가 감소하는 것처럼 소비자는 소비를 유예하거나 보류하게 된다. 기업들도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신규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투자를 유예하게 된다. 결국, 소비ㆍ투자 모두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경제 전반의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 가격 하락은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감소, 임금하락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상품ㆍ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디플레이션은 심화한다. 이러한 현상을 디플레이션 소용돌이(deflationary?spiral)라고 한다. 경제학자?피셔(Irving?Fisher)는 “경제 전 영역에 걸친 파산” 이후에야 상황이 궁극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을 만큼 한번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면 경제 전반의 정상화까지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8월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0.04%, -0.4%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으나 작년에 폭등했던 농ㆍ축ㆍ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와 정부 복지정책 강화 효과에 주로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 효과들을 제거하면 1%대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다시 1%대 물가상승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