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왜 재상 채제공인가?

“매점ㆍ독점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이 큽니다. 국가의 쓰임에 응하기 위해 육의전 이외의 난전을 금하는 법이 있는데, 요즘 무뢰배들이 난전을 금하는 법을 멋대로 적용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저해하고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난전을 벌였다 하여 붙잡혀온 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처벌을 주장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원성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마지막 대목이 인상적이다. 통공정책의 시행을 주장하는 좌의정 채제공의 말이었다. 특권적 상업 독점권을 폐지하려는 통공정책은 이미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독점 상인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채제공은 일반 소상인과 소생산자를 위해 다시 시행을 주장했다.
정조 15년(1791)에 시행된 이것이 바로 ‘신해통공’이었다. 훗날 정약용은 이렇게 평가했다. “반대하고 불평했지만, 신해통공 조치 후 1년 만에 물화가 모여 일용품이 넉넉해졌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원망하던 자들도 칭찬했다.”
채제공은 정치적 소수파인 남인계였다. 정조는 주위의 극렬한 반대에도 그를 우의정에 기용했다. 바로 정조의 탕평 정치의 일환이긴 했지만, 채제공이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채제공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수원화성 축성과 신도시 수원 건설의 총책임자로서의 공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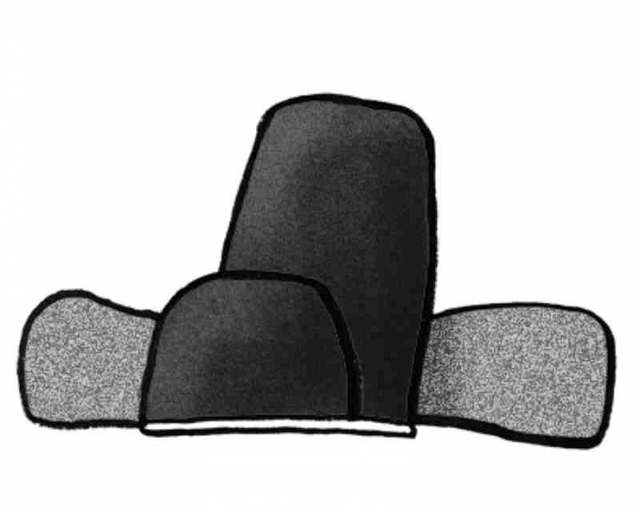
우리가 주목하는 조선시대 인물을 보면, 명분론을 내세운 강성 이데올로그에 치우친 감이 있다. 공동체를 위해 실제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학자 하면 주로 재야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불우한 선비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학의 본령은 실심·실사·실공에 있었다. 즉 진정성을 갖고 실제의 일에서 실제적 성과를 남기는 것이 핵심이었다. 실학박물관과 학계가 관직에 나아가 실제적 성과를 이룬 ‘관인학자’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가령 대동법 개혁의 주인공인 재상 김육과 같은 인물이 그 예이다.
한국실학학회는 ‘관인학자의 실학적 성향’이란 주제로 학술모임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인물이 재상 채제공이다. 올해가 마침 그가 태어난 지 300주년이다. 실학박물관이 채제공에 관한 학술심포지엄을 학회와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9일이다. 또한, 이에 앞서 5월 19일부터 채제공에 관한 기획전시를 열 예정이다. 수원화성박물관과의 공동기획전시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다. 그 와중에 치러진 총선에서 한쪽 진영이 몰락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민생을 위해 실제적 성과를 내는 실행력이야말로 공인의 중요한 덕목이다.
김태희 실학박물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