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맹자와 플라톤의 대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정치인으로서 혹은 사회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맹자와 플라톤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었다.
맹자(孟子)와 플라톤은 기원전 4~5세기에 거의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이 두 철학자가 살았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혼란의 시기였다. 맹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중국의 서로 죽고 죽이는 분열과 질곡의 춘추전국(春秋戰國)시기였다. 플라톤 역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무렵 다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패권을 둘러싼 30년간의 전쟁인 펠레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태어나서 활동했다. 이 시기 두 지역의 권력자들은 백성의 고통은 안중에 없고 권력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대는 플라톤을 무엇이 올바른 국가이며 개인인가, 그리고 그러한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매달리게 했다. 플라톤은 올바른 국가는 지혜를 가진 철인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고, 용기를 지닌 전사 계급에 의해 지켜져야 하고, 다수의 생산자가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면서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올바른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모든 덕에 알맞게 그 기능을 발휘할 때 ‘정의(Justice)’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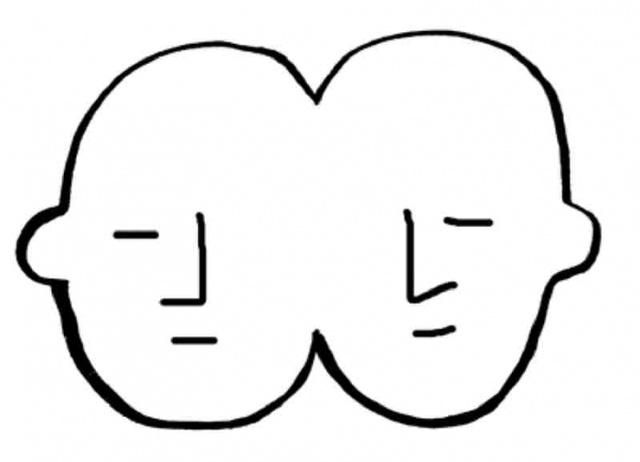
한편, 맹자와 플라톤의 사상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각자의 충실한 역할’은 공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당시 군주인 경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한 것과 맹자의 오륜(五倫), 즉 ‘친의별서신(親義別序信)’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맹자는 여기에 덧붙여 하늘의 뜻(天心)이 바로 민심(民心)으로 군주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혁명적 사상도 고취했다. 그는 “백성이 제일 존귀하고 정부는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이라고 했다.
플라톤도 어느 한 집단이나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의(正義)로운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지도자가 자신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때 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맹자도 “백성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알고 백성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하는 지도자 중에 군주가 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樂民之樂者…憂民之憂者…不王者, 未之有也)”라고 했다.
이 두 동서양의 철학자의 말대로 한국의 정부와 사회 지도자들은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의로운 방법을 찾는데 그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박기철 평택대 중국학과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