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태종의 시대인가, 영조의 시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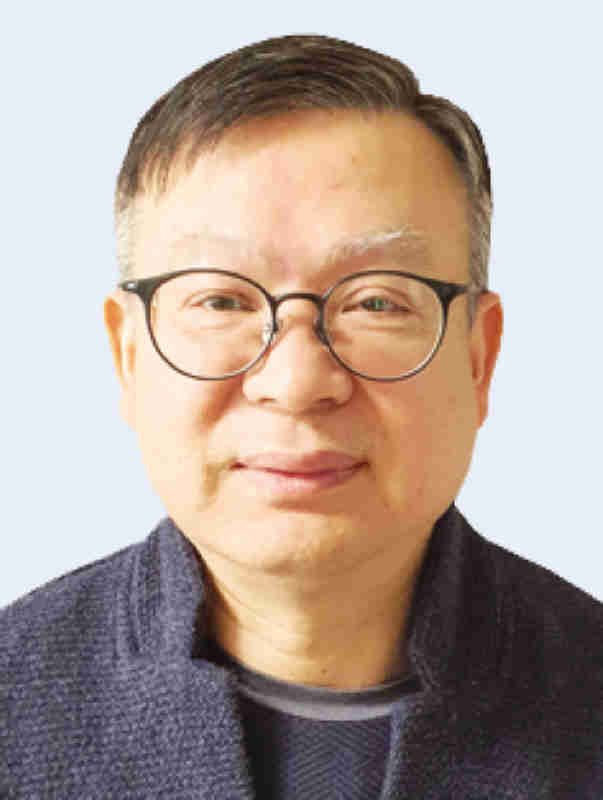
얼마 전 한 정치인이 시대를 빗댄, ‘태종의 시대’란 말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다. 아마 새로운 시대를 연 조선왕조의 전환기적 업적보다 ‘세종의 시대’를 염두에 둔 얘기로 들린다. 그런데 태종의 많은 업적 중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좋은 업적이 생각나지 않는다. 사돈마저 죽인 그는 오히려 왕조의 기틀을 만든 임금보다는 왕조의 안정만을 극도로 추구한 임금으로 기억된다. 고려왕조의 충신 정몽주를 피살하고, 역성혁명에 앞장선 그는 조선 개국 후 정도전마저 죽여 피의 숙청을 시작한다. 이 두 인물은 성리학을 국시로 하는 조선왕조에서는 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정몽주는 조선 최초의 문묘에 종사 된 반면, 정도전은 조선말 고종 때 공신복권이 된다. 당시 수렴청정을 하던 신정왕후는 “정도전이 전각의 이름을 정하고 송축한 문구를 생각해보니 천 년의 뛰어난 문장으로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로 그에게 시호를 내리도록 한다.
정도전은 궁궐을 정의하기를, 임금이 정사를 다스리는 곳이요, 사방이 우러러보는 곳이요, 신민들이 이르는 곳이라 했다. 임금을 중심으로 신하와 백성의 소통이 이뤄지는 곳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근정전은 단순히 임금이 근면하기만 하면 될 것인가. 이 해답은 그가 낸 과거시험 문제에 나와 있다. “부지런할 줄만 알고 부지런히 할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폐단은 지나치게 감시하여 다스리는 것에 보탬이 없을 것이다.”

이즈음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창한 것만으로 태종의 시대를 빗댄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지만 주변국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명나라에서는 영락제가 피의 숙청 뒤 주변나라에 대한 사대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심지어 태종은 공녀(貢女) 요구에 순순히 응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영조는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되 과감한 사회개혁과 질서를 화합의 기틀로 삼은 사람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극복하고, 효제(孝悌)를 통한 체제 정비를 시도했고, 기록을 통해 역사의 순기능을 남기려 애썼다. 지금 우리가 아는 개혁군주로서의 정조임금의 이미지는 사실상 영조의 시대가 고통을 감내했기에 존재한 것이다. 수원화성과 융ㆍ건릉은 그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소령원에서 발현됐고, 노량진 배다리는 임진강 배다리에서 얻은 아이디어며, 각종 능원의 정비, 의궤와 기록조차 영조를 쏙 빼닮은 것이다. 더구나 청계천과 균역법의 역사는 두고두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개국이념을 실천하는 근면한 임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수원화성이란 위대한 역사를 완성한 정조가 소비의 시대였다면, 영조는 다음 시대를 준비한 생산의 시대였다. 우리는 과연 보스형 군주 태종의 시대를 살 것인가,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고자 한 영조의 시대를 만들 것인가. 영조의 시대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차문성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