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조선시대 역병과 코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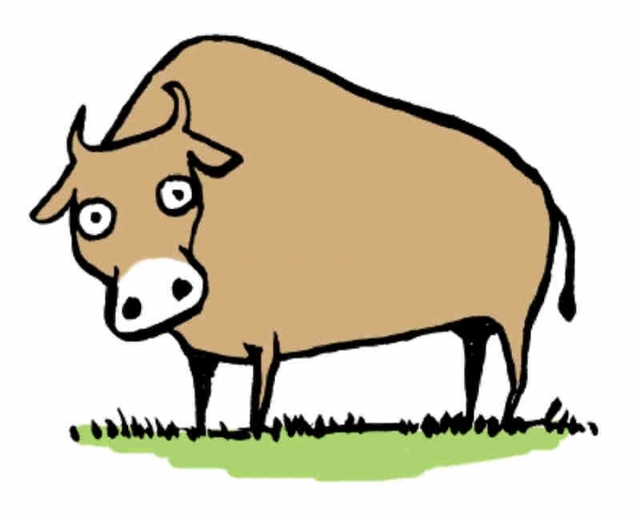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인이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과거 역시 이 같은 팬데믹으로 절규와 고통 속에 산 적이 있다. 중세시대는 페스트로 시작해 페스트로 끝났다고 할 정도로 전염병의 시대였고, 근세 때 인플루엔자는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유럽 분수대에는 흔히 전염병 극복을 위한 성인상이 지금도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역병은 조선시대에만 600건이 훨씬 넘었다. 그 중에서도 17세기에는 갑자기 발생빈도가 증가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우역 즉 소의 역병이 극에 달하게 된다. 이는 중국과의 개시를 통해 수입한 소에 역병이 번진 것이다. 그런데 재작년 몽골에 갔을 때 테렐지에 있는 소를 유심히 살펴보니 우리나라 누렁이와 흡사하게 닮아 있다.
우리나라 소와 몽골 소는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을까. 현종 4년 관서지방에 소 1천두가 죽자, 과거 병자년(1636)과 정축년(1637)에 죽은 소가 얼마나 되는지 묻게 된다. 당시 거의 남아있는 종자가 없어 몽골에서 직접 소를 사온 것이다.
성익 일행은 심양에서 서북쪽으로 16일을 가 오환왕국에 도착했고, 또 3일 만에 내만왕국에 갔다. 거기서 동북으로 4일을 가 도달한 곳이 삭도왕국이었다. 다시 3일 만에 몽호달 왕국에 도달한 뒤, 동쪽의 투사토 왕국과 소토을 왕국을 지나 마침내 수입지 빈토 왕국에 도달하게 된다. 먼저 53마리를 보낸 뒤 소 181마리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무려 6개월간의 대장정이었다.
쉽게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몽골인지 의문이 들겠지만 당시 청나라에서도 우역이 끊이지 않아 청정지역인 몽골에서 소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를 종자로 해 다시 정상적인 일상이 있었지만 현종, 숙종 때 사람과 가축의 역병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세기에 들어 이러한 역병이 현저히 줄게 된다. 그야말로 항체이든 몽골소의 영향이든 겨울이 끝날 시점에 출발해 초여름에 조선에 도착한 소는 최상의 상태였던 것이 분명하다. <조선왕조실록>에 소의 이상에 대한 보고는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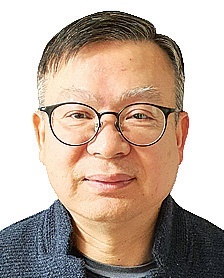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시름하는 지금도 당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를 추적하고, 극단적인 봉쇄 없이 사람들이 오가는 데는 K-방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전 미국을 다녀오면서 방호복까지 입은 승무원과 공항의 철저한 검역과는 달리 공항 밖은 이미 역병에서 벗어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팬데믹 이후에도 이제 이전의 자유로움은 다시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농사는 백성의 근본입니다. 우역 후 농사지을 방법이 없으니 앞으로 백성들의 일이 심히 걱정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외침 속에 국난을 극복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차례다.
차문성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