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공직의 무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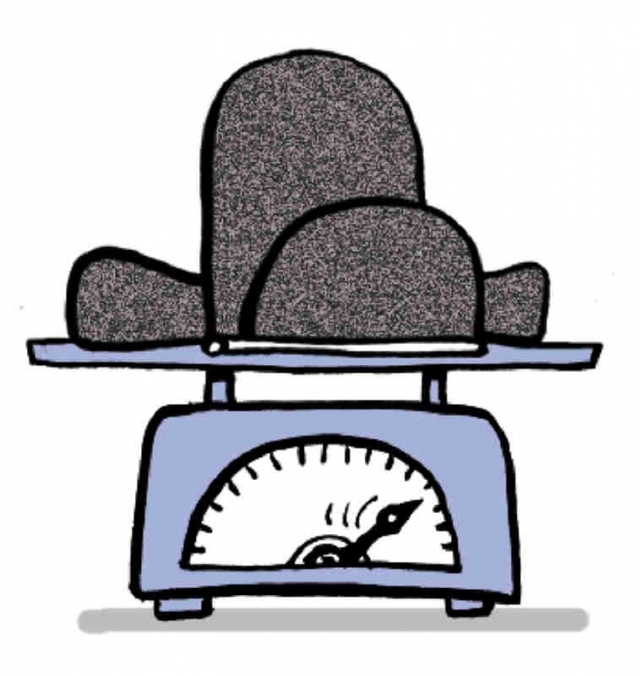
“부패즉사, 청렴영생”을 외치던 한 도지사가 있었다. 아무리 유능한 직원도 일단 부패에 연루되면 예외 없이 배척했다. 사법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양심적인 부정이 남았다면 이 역시 예외가 되지 못했다. 공직자로서의 뛰어난 역량에도 예외 없이 배척되는 것이 때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면이 다 갖춰져 있어도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그리고 필수적인 기본소양은 청렴과 양심이라고 본 것이다.
인생 속 가치관이 부딪치고,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움은 늘 존재한다. 이럴 때 늘 고민하는 것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 어디인가이다. 공직자도 공익을 추구하는 그 사명 속에서 늘 이 고민 속에서 살게 된다. 전직 도지사께서 공직자가 된다는 것, 공적자금을 쓴다는 것에 그토록 엄격한 자기절제를 요구했던 그 확고한 철학도 이 맥락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닐까.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절대적 선은 역설적이게도 가치관의 대립 속에서 깨닫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관의 대립이 점차 커지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옳고 그름의 인식은 점차 흐려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건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의 사례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 공인이 된다는 막중한 사명 아래 공직자로서의 양심은 무엇인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여진 국민의 성금, 국가 지원금의 사용처마저 불투명하게 회계처리 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아닌가. 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정립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역사적 비극으로 인식시켜 온 그 간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직을 맡게 되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책과 직급을 막론하고 공인에게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과오는 묵인될 수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인의 위치가 아닌가.
김동근 경기도 前 행정2부지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