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실사구시는 당파를 초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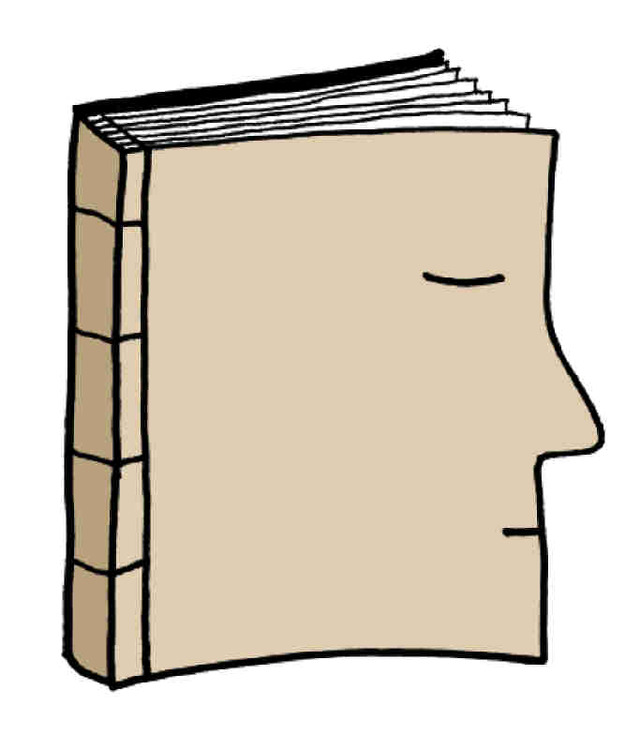
올해가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저술한 지 350년, 간행한 지 250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여 실학박물관에서는 특별기획전(반계수록, 공정한 나라를 기획하다)을 진행 중이다. 저술에서 간행까지 무려 100년이 걸렸다. 그 100년의 의미는 예사롭지 않다. 우선 개인 저술을 나라에서 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영예로운 일이었다. 100년 동안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다림, 그리고 당파를 초월한 공감이 있었다.
유형원은 19년에 걸친 필생의 역작 <수록>을 완성하고,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수록>은 토지제도를 비롯하여 인재 교육과 선발, 관리 임용과 녹봉, 그리고 국방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국가의 공공성’과 ‘제도의 공정성’을 도모한 ‘나라 살리기 기획’이었다. 나라에서 쓸 책인 것이다. 유형원의 학문적 동지이자 사돈인 배상유가 <수록>을 나라에 추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호 이익은 “환자는 있으나 신통한 약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며 개탄했다.
남인의 탕평론자 오광운은 <수록>의 서문을 지어 정치 법제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밝혔다. 소론의 지도자인 명재 윤증도 <수록>의 가치를 알아보았다. 그의 제자인 양득중이 영조에게 ‘실사구시’를 진언하면서 <수록>을 추천했다. 균역법 시행에 힘썼던 노론계 홍계희는 어려서부터 <수록>을 읽고 매료되어 영조에게 간행을 청했다.

마침내 1770년, 영조의 명에 의해 <반계수록> 26권이 영남 감영에서 간행되었다. 당색을 떠나 실학자들은 <반계수록>을 정독했다. 홍대용, 이덕무 등은 조선의 대표적 경세서로 <반계수록>을 꼽았다. 정약용은 <경세유표> 서문에서 자신의 책이 <반계수록>을 잇는 것임을 은연중 자부했다. 실학자들의 경세론은 <반계수록>을 디딤돌로 하여 제도개혁의 고민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물이었다.
일에서 실제적 성과를 얻으려는 사람은 당파나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는다. 바로 ‘실사구시’의 자세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임무’에 뜻이 있는 사람은 <반계수록>의 정신과 실질을 살려 나갈 것이다.
김태희 실학박물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