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도 예술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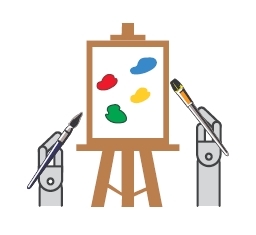
바둑의 규칙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유는 소문으로만 듣던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기능을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척척 돌을 놓는 인공지능을 상대로 연달아 패하던 이세돌이 한 판의 승리를 거뒀을 때, 마치 인류의 승리를 목도하는 것처럼 탄성을 질렀던 기억이 난다. 하긴 바둑이야 룰과 승패가 있는 경기니까, 인공지능이 수많은 기보를 학습해 최선의 수를 뽑아내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안도했던 것 같기도 하다. 반면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인간의 결과물과 별다른 구분이 어렵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는 나 자신 예술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을까?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가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보란 듯이 높은 가격에 낙찰됐고, ‘AI 아트’를 새로운 장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지금, 여태 가지고 있던 예술이라는 개념이 이미 지각변동을 시작했다는 자각이 섬뜩하게 밀려온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았다. AI가 그렸고 크리스티에서 낙찰됐다는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를 말이다. 일단 번듯하게 금빛 액자에 끼워져 있는 이것은 어떤 남성의 초상을 그린 것이다. 대범한 붓질로 화면이 분할돼 있으며, 흰 여백을 평면적인 공간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 있고 어쩌고를 논평할 수 있겠지만, 어쩐지 별로 그럴 마음이 나지는 않는다. 작품의 안에 있을 ‘의도’가 전혀 궁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면 ‘에게~’ 소리가 나올 만큼 작은 작품 <모나리자>는 말년에 프랑스 왕의 말동무나 하러 가게 된 처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이탈리아에서부터 프랑스로 가지고 이동한 작품이다. 국경을 넘으면서까지 들고 다녔던 그 여인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온갖 해석들이 붙는다. 다 빈치가 내심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다는 설부터 작가 자신의 여성형 얼굴이라는 추측까지 말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모나리자의 묘한 미소에서 작가가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작품 앞에서 우리는 500년 전의 인간 다 빈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묻게 된다. 불완전한 한 인간이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꽃피운 그 어떤 것, 그것만을 ‘예술’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21세기에 적응하지 못한 20세기 인간인 것일까? 그럴 수도, 혹은 아닐 수도. 답을 찾고 싶다.
이윤희 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