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갯벌 매립에 대한 생태문화적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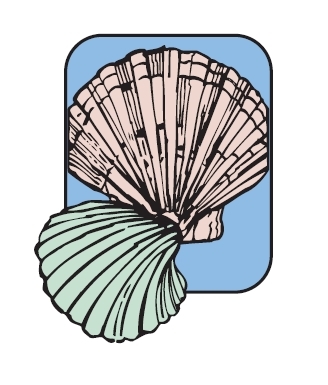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인문강좌 ‘미추홀 시민로드 역사를 거닐다’를 시청했다. 첫 번째 강좌는 ‘물의 도시, 미추홀’을 주제로 김용하 인천도시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는 대동여지도(1861년)에서 시작해 1917년 조선총독부 이름으로 나온 지도를 토대로 지난 100년간 인천의 해안선과 연안의 섬들의 엄청난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인천 연안의 섬 47곳 중 26개 섬은 일부가 매립(또는 다리로 이어짐)됐고, 12개 섬은 완전 매립됐으며 현재 9개 섬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어릴 적 낙섬에서 또래들과 물장구치며 놀던 기억에 잠시 잠겼다. 그곳은 이미 매립돼 ‘낙섬사거리’라는 이정표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갯벌 매립은 기존의 육지를 부지로 개발하는 것보다 깔끔한 직선도시로 개발이 용이했으며 보상비 없이 이윤을 내는 사업이다. 인천 최대 규모의 갯벌 매립은 약 1천600만평 규모의 송도국제도시다. 이 규모는 부천시와 맞먹는 규모라고 한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갯벌 매립에 의한 영토 확장은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지속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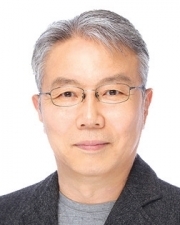
한 예로 ‘2015 제1회 피스로드 심포지엄’에서 당시 세종연구소 부원장은 파격적인 국가 개조 전략을 발표한다. ‘한국의 생존 전략-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만 일대 갯벌 10억평을 매립해 부지를 확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분양 수익을 제2의 국민연금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갯벌은 ‘보이지 않는 영토’에 불과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과 지구에 대해 과도한 매립의 가해행위는 멈출 때가 됐다. 오히려 유럽 북해지역인 바덴해의 경우 갯벌을 복원한다. 개인과 더 큰 사회 및 자연환경과의 동심원적 연결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전체와 조화롭게 사는 삶’을 도모하는 생태문화적 기획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명 전환 차원에서 개종하다시피 하는 수행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광일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