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장애인 편견을 바꾸는 당신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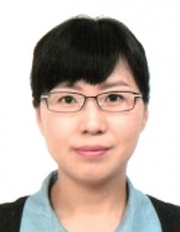
2014년, 국민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염전노예’가 일으킨 반향은 컸다. 카피의 힘이랄까. ‘염전’이 상징하는 고된 노동과 족쇄가 연상되는 ‘노예’의 합성어는 장애인차별과 학대실태에 대해 국민학습의 장을 이끌어냈다. 더불어 인간다움의 경계를 스스로 자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성 여부로 인간을 바라보게 된 이후,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숫자 매김을 당연시하고 장애인차별 심화 과정을 암묵적으로 방조해 왔다. (생산성이 부족한)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 몇 명의 장애인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시설인데 (비효율적으로)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나, 돈 들여 (굳이) BF(Barrier Free)인증을 받아야 하나, 열 평 편의점이나 소규모 음식점에 (법적 의무도 아닌)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부족하고 무능한)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부정적 의문은 장애인은 생산적이지 않다 여기고 소비자로서의 취향과 능력은 거세시키며 사회가 용납한 부분만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그마저도 감지덕지해야 할 비인권적 존재로 낙인찍었다.
언론에 의한 ‘염전노예’는 이런 사회를 바꿔 나갔다. 장애인 권익 옹호에 관한 법령과 기관이 생겨 장애인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다시, 인간다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서야 ‘꺼리’를 찾는 기자의 글은, 단편적이므로 기사 방향이 현장 욕구와 달라 크게 도움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도 이끌어내기 어렵다. 언론에 큰 기대 없던 시절, 장애인 현안을 고민하던 내게 경기일보 기자가 기사를 써보자고 했다. 유형별 장애인 단체들의 고충과 애로점이 연속 기사로 나가던 때 느꼈던 짜릿함은 표류한 돛단배의 사공이 구조선을 만난 느낌과 같았다.
약자의 편에 선 언론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구나. 이후에도 경기일보 사회부 기자들과 일 할 때 비슷한 에피소드가 많았다. 발로 뛰는 근성도 칭찬할 만 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을 때 문자 몇 줄만 보내도 제대로 써 줄 것만 같은 신뢰를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다. 고충을 공감하는 감수성, 장애인권을 바라보는 담담한 시선, 문제를 왜곡 없이 드러내는 뚝심. 그것은 신뢰가 바탕이었기에 가능했다.
‘염전노예’ 사건도 그랬으리라.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시각이 범인과 같았다면 나오지 못할 기사였다. 장애인권 감수성을 갖춘 기자 한 명은, 그래서 힘이 세다. ‘정상사회’와 자본주의의 천박한 카르텔을 꿰뚫는 시선, ‘정의로운 펜’이 만들어내는 힘은 장애당사자들이 권리 쟁취를 위해 절규하는 것만큼이나 크다.
그러므로 여전히 당신들이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피고, 눈물을 분석하고,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국가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당신들이, 좁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외골수인 당신들이 필요하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눈 맞춰주셨던 수많은 ‘당신들’ 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고맙습니다.”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