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온 마을 사람들 ‘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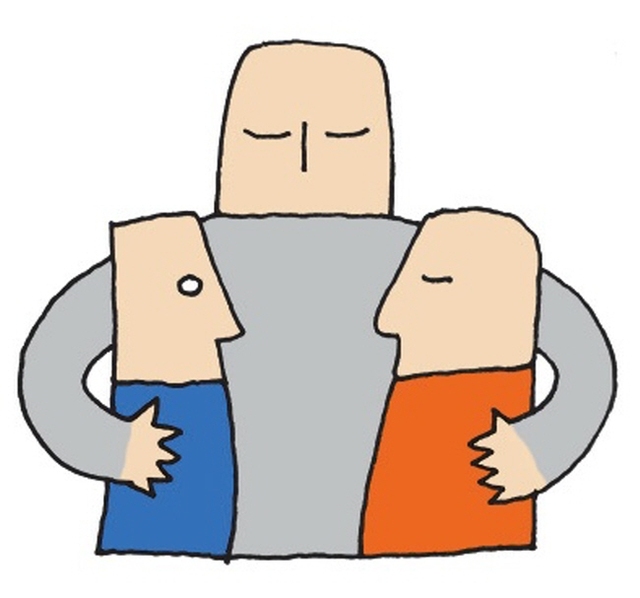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이제 익숙한 말이 됐다. 온 마을 학교, 온 마을 축제, 온 마을 배움터 등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여러 영역에서 ‘온 마을’이라는 단어는 곧잘 등장한다. 한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얼굴을 마주치던 시절에는 아이들을 서로 돌봐주고 관심을 갖는 것이 가능했다. 심지어 또래들과 놀다가 끼니때가 되면 친구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과 규칙, 하다못해 놀이 방법에서 장례 의례까지 이 모든 것을 온 마을 안에서 배웠다.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각기 달라졌고 이웃의 개념 또한 변했다. 삶의 유동성이 증대하면서 ‘온 마을’은 불안 사회의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의 재등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깨달음으로 아프리카 속담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하는 형국에 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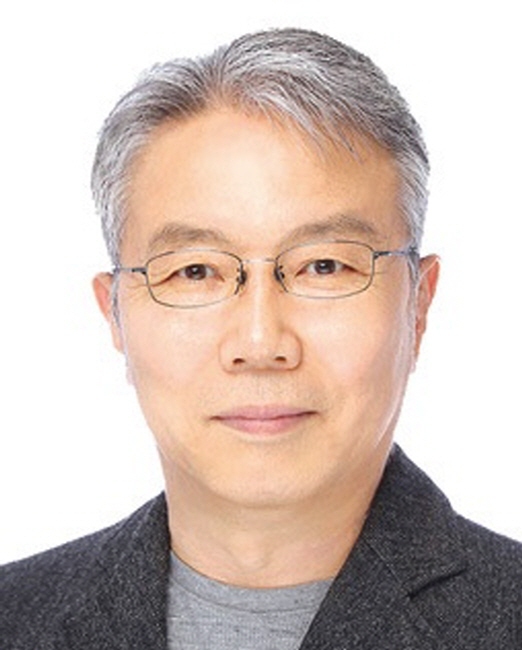
온 마을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은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온 마을 자체가 새로운 집단을 명명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온 마을 사람들은 다중(多衆)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다중은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특정한 사안에 동의할 때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많은 수의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대중(大衆)’과 다르고,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인 ‘민중(民衆)’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중은 사람들 각자가 개별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중은 집단의 굴레에서 벗어난 ‘나’가 있는 우리다. 우리 각자가 ‘사람들’에서 ‘그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다중이 사는 온 마을로 거듭나는 것이다. 다중의 존재 의미야말로 아프리카 속담을 작금의 현실로 소환하게 하는 문제 인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현광일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