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해운산업의 ‘공정성’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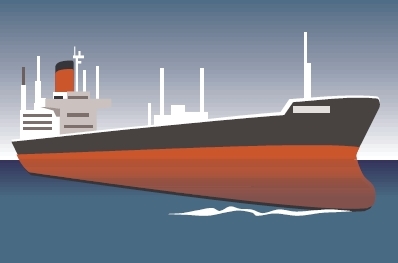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논란이 된 화두는 다름 아닌 ‘공정성’에 대한 것이다. 기본소득, 검찰수사, 인사, 올림픽 출전, 성과급, 부동산,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걸핏하면 공정성이 논란이 된다. 최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조국 사태는 공정성 논란의 종합판이다.
공정성 논란이 최근에는 국내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업에서 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동남아노선 컨테이너선사들 122차례 운임 합의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천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나서는 중이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맞선다. ‘해운사들은 운임ㆍ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29조가 반박의 근거다.
누가 옳은지는 행정적 또는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공정성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는 고객에 대한 ‘갑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생존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운업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이상을 불황 속에서 허덕여왔다. 한진해운은 파산했고, 중견ㆍ중소 해운사들도 휘청거렸다.
둘째, 공동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정답이냐에 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동행위가 제한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정기선 해운의 공동행위는 무역을 촉진하고 수출입 기업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만약 공동행위가 전면 금지된다면 해운시장은 국내외적으로 독점 또는 과점시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독과점 시장에서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수출입기업들과 소비자들이다. 그래서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처도 저마다 다른 것이다.

셋째, 과징금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과징금 액수는 해운산업을 파멸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후생을 높이겠다는 공정위의 조치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불러올 수 있다. 제2의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것이다.
넷째, 해운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높다. 해운업에 대한 담당 관청인 해양수산부가 명확한 법적·제도적·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치고 들어온 셈이 됐다.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제도적 허점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측면도 있다.
공정위의 조치가 해운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것이 돼야 한다. ‘죽음의 매’가 돼서는 안 된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