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이제는 정책 전환 고려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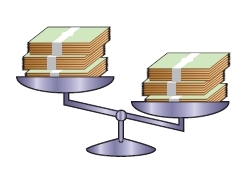
정부는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한다. 추경 규모만도 33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대에 부딪히자 소득 하위 80% 이하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조정했다. 대신 소득 상위 20%는 상생 소비지원금을 지원한다. 2분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분기에 더 사용한 금액의 10%만큼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정부의 무리한 소비 진작책으로 인한 카드대란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가계부채 부담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는 현재까지도 우리 경제가 안은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나섰다.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초저금리 팽창적 통화정책으로부터의 정상화를 시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이 이미 명목 GDP의 두 배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만 해도 명목 GDP에 육박한다. 설상가상 금융취약성 지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무려 약 40.6%나 상승했다. 자산 가격만으로 평가할 때 현재 상황은 19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 그 취약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관리 기준도 GDP 대비 40%에서 60%로 바꿨다. 이미 국가채무는 1천조원에 육박한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유동성 파티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조차 이미 물가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 통화정책에서부터 출구전략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연방준비은행의 자산매입 속도 조절을 논의했다. 동시에 유동성 함정 우려에 재정 긴축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거품경제를 걱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재정 건전성에도 보다 신경 써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특성상 충격과 위기의 가치 사슬로부터 겪게 될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