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미추홀’의 토포필리아를 생각하며

자랄 때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문지방을 밟지 마라’,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 ‘아홉수를 조심하라’ 등 여러 금기에 대해 거부하면서 반항하던 시절이 있었다.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신화적 금기들이 거북스러웠던 것이다. 동네지식인을 자처하며 로컬(local)한 삶에 관심을 갖다보니 내가 사는 구(區)의 ‘미추홀’이라는 단어의 신화적 의미에 관심을 갖게 됐다. 미추홀의 ‘미’는 ‘물’의 한자표기이고 ‘홀’은 ‘성(城)’을 의미한다. 고대의 지명은 대개 지형이나 지세에 따라 지은 것이 많으나 거기서 거대한 이야기의 세계와 만나게 된다. 미추홀에 위치한 문학 산성에서 발굴되는 유적들과 ‘바다에서 떠내려 온 섬’인 수봉산 설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화적 상징들은 사료 못지않게 하나의 서사를 일궈낸다.
신화는 당대의 문명적 기틀을 마련하는 담론이다. 미추홀은 고대 비류 백제의 건국과 관련 있는 지명이며 지리적 조건상 경기만 일대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백제는 이웃나라 일본의 신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 하나다. 고구려 주몽 신화나 신라 박혁거세 신화보다 백제의 건국은 세계의 초월성과 신성성을 결여해 신화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추홀이라는 지명 안에 담겨진 비류 백제의 건국은 서울 풍납동 일대의 한성 백제 유적지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신화적 상상력의 한 단서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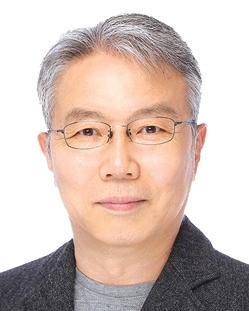
신화는 하나의 의사소통 체계이자 메시지가 된다. 합리적 역사의식만으로는 고대의 신화적 상상력에 범접할 수 없다. 나라마다 우주선을 띄우는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면서도 현대 문화에는 신화의 그림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삶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 현대 문명의 위기 징후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궁에 갇혀 있을수록 신화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터를 닦아가는 생태적 지혜들을 되짚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비류 백제의 서사화를 통해 미추홀 주민의 토포필리아 형성에 기여하려면 인문지리적 접근과 고전문학의 신화적 상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현광일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