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시집살이 詩집살이

사박사박/장독에도/지붕에도/대나무에도/걸어가는내 머리 위에도/잘 살았다/잘 견뎠다/사박사박. 전남 곡성의 윤금순 할머니가 쓴 시 ‘눈’(시집살이 詩집살이 수록)의 전문이다. 내 머리에도 내리는 눈을 맞으며,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하는 시편이 인상적이다. ‘잘 견뎠’고, 그래서 ‘잘 살았다’로 이어지는 마무리를 읽으면서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이 훅 다가온다. 투박하지만 필자의 심금을 울린 시편이다.
특별한 것은 이 시를 쓰신 분이 2009년에야 한글을 배운 할머니라는 점이다. 전남 곡성에 있는 작은 마을도서관에서 할머니들이 책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할머니들은 책을 거꾸로 꽂거나 제대로 찾지 못했다 한다. 이런 모습을 본 마을도서관장이 한글 수업을 제안해 한글 배움이 시작됐다고 한다. 한글도 모르시던 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한글을 깨우쳐, 자신들의 삶을 시로 풀어냈다는 것이 놀랍다. 이 이야기는 ‘시인 할매’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문해교육은 그래서 중요하다. 문해 능력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할 줄 아는 역량에 그치지 않는다.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제이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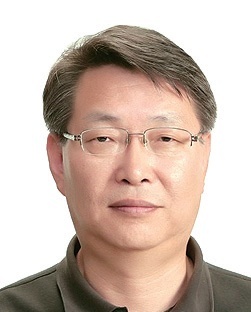
시집을 내신 할머니들의 문해교육은 민간에서 만들어진 마을도서관에 의해서 시작됐다. 감사한 일이다. 문제는 문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불가능한 성인 비문해 인구는 3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성인의 7.2% 수준이다. 여기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 학력 미만의 저학력 인구는 517만 명 규모로 성인 13.1%가 문해 교육 대상자다. 민간의 자발적 교육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글을 배워 시집까지 낸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감동스럽지만 그 감동이 문해 교육의 제도화로 나가지 못해서 안 된다. 성인 열명 중 한 명 이상이 필요로 하는 교육인데 정부의 재정은 33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5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을 뿐이다. 문해 교육이 필요로 한 모든 국민에게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성인기초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시작해야 한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