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이름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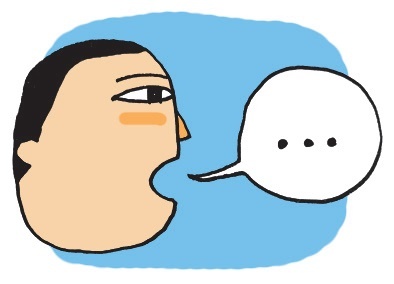
몽골 여성 ‘막사르자의 온드라흐’씨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할 때 남편이 ‘막사르자의’라고 써야 할 것을 ‘막살자’로 잘못 썼다고 한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순회 의사가 병원 차트에 걸린 대로 ‘막살자씨’로 부르는 통에 옆 침대의 수술환자가 웃다가 수술 실밥이 터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기억에도 생생한 월드컵 4강 신화의 히딩크 감독이 전술훈련차 유럽을 돌 때 상대팀에게 모두 패하고 월드컵 출전에도 탈락한 체코팀에게도 5:0으로 패하니 그의 이름을 아예 오대영이라고 부르며 비난한 적이 있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거나 제멋대로 부를 일이 아니다. 김춘수는 그의 시 ‘꽃’에서 이름의 소중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격언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남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새내기 공무원 생활에 적응하려고 힘들어할 때 길 건널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 총장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침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추천하고 싶은 직장이 있으니 내일 총장실에 한번 들려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의 보람된 길을 걷게 하셨다. 제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교수님에 대한 존경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있다.
어린 시절 여러 마리의 토끼를 길렀던 카네기가 일일이 풀을 뜯어다 주는 일이 힘들어지자 친구들을 모아놓고 풀을 많이 뜯어오는 사람에게는 토끼에다 그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했다.
아이들은 토끼에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풀을 뜯어왔다고 한다. 강철왕 카네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착을 느끼고 있는지를 일찍이 간파한 사람이다. 양주동 박사님은 첫 강의 시간에 수강 신청한 학생 전원에게 차례차례 돌아가며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자신 소개를 하라고 하셨다. 숫기가 없어 입속으로 우물우물하는 학생에게는 야단을 치시면서 어른들이 지어주신 소중한 자기 이름을 남이 알아듣게 분명히 말하고 하셨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쿤타킨테의 투쟁을 그린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를 설명하면서 내 이름은 조부님께서 뿌리를 북돋우면 그 가지가 무성하다(培根枝達)는 사자성어를 바탕으로 지어주셨다고 말씀드리니 교수님의 얼굴이 환해지셨던 기억이 새롭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지금은 자기를 피 터지게 알린다는 피알(PR)시대이어서 한번 듣고도 잊혀 지지 않는 이름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였다. 한번 듣고도 쉽게 기억되는 이름 중에 최고야, 이호선, 이기자, 백장미, 주인공 등이 있다. 어린이재단에서 장애아시설을 신축하고 이름을 짓기 위해 전 직원 공모를 했는데 ‘한사랑 마을과 한사랑의 집’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당시 한글학회에 자문했더니 우리나라 말 가운데 “물, 불, 쌀, 굴, 말, 글처럼 가장 필수적인 말은 모두 받침이 미래를 위해 탁 트인 ‘ㄹ’로 끝난다면서 ‘한사랑 마을’을 추천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