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사회적 경제서 ‘가치 해석의 정치’ 열다

삶을 말할 때, 대략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단순히 산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자는 오이코스(oikos, 가정)의 사적영역에 국한됐다면 서양의 정치적 전통에서 후자의 폴리스(polis)라는 공적영역은 ‘생겨나기는 삶을 위해서지만 존재하려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다’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삶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오직 생존에만 매달리는 삶을 지독하게 경멸했기에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행위를 추구했던 것이다.
사적 영역으로써 가정의 활동은 주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이었다. 경제(economy)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근대에서의 시장 출현으로 가정경제는 시장경제가 됐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하면서 가정과 직업이 분리돼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곳은 가정 밖의 ‘사회’다. 단지 살기 위해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적 의미를 획득한 곳이 사회다.
이제는 삶과 복지에 관한 이슈가 사회 문제로 등장한다. 기본소득처럼 생존의 어떠한 필요에 대해 공공적 대응이 필요해 졌다. 특히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는 사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의 경계선을 둘러싼 쟁점으로 부각된다. 공공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존재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차원에도 깊이 관여한다. 비로소 생존의 필요와 삶의 질 고양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해석의 정치’가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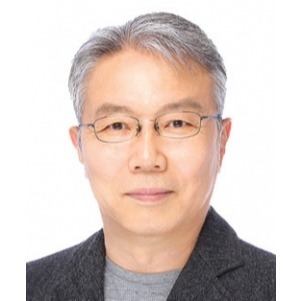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 해석의 정치’가 행해져야 할 차원을 포함한다. ‘가치 해석의 정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충족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가치의 정의 및 의미 규정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공공영역에서 담론적 쟁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공적 자원의 분배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초등 방과 후 돌봄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학교와 지자체의 갈등은 ‘가치 해석의 정치’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각계에서 관심을 쏟는 삶의 ‘지속가능성’이나 유네스코가 제창해 협약으로까지 만든 ‘문화다양성’ 개념 또한 가치 해석의 정치 지평을 열어줄 담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가치 해석의 정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치행위다.
현광일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