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경제사령관의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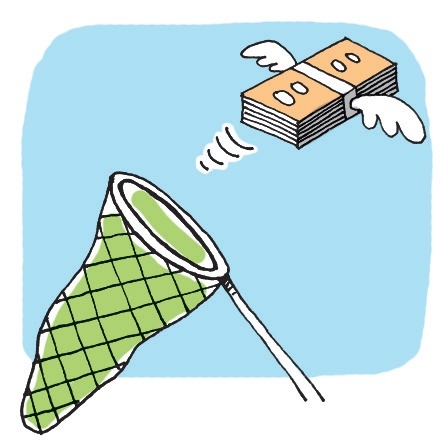
16.4%.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향해 급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만 보더라도 전국 고령인구비율과 맞먹는다. 경기도는 그나마 고령사회 문턱에 걸려 있다. 하지만 동두천,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수년 내에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은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다. 소비위축은 말할 것도 없다. 소비위축은 세수감소로 직결된다. 소득 없는 초고령사회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경제사령관의 말에는 무게가 없다. 오락가락이다. 그의 말은 180도 달라져 있다. 국가채무에 대한 그의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느 순간 국가채무의 마지노선이 국내총생산 기준 40%에서 60%로 절반이나 급상향했다. 주변 우려를 의식했는지 통합재정수지를 함께 결합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재정지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있는 일이다.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말할 때 항상 보기 좋게 내세우는 근거가 OECD 회원국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알고 그러는지 애써 외면하는지 언제나 그렇다. 수출이 거시경제의 핵심인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과 내용이 국가 신용등급과 대외 신인도와 직결돼 있다. 더욱이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나라는 적정 외화보유고 유지도 거시경제 안정에서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미 올해 국가채무는 900조원를 넘어 내년도 국가채무는 1천조원를 돌파할 예정이다. 국가채무 가운데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 적자와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자 등 소위 나쁜 채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문턱에서 노년부양비 등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은 더욱 늘 수밖에 없다. 지금 시기에 다소나마 재정부담을 덜고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길은 일하는 사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