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계절 바뀌듯... 다가오는 미래학교
교사 2년 채우고 도망가는 혁신학교, 개인 열정에 의존말고 제도 변화해야 가까운 미래의 유일한 희망은 ‘교육’...자치문화 기반 지속가능한 길 모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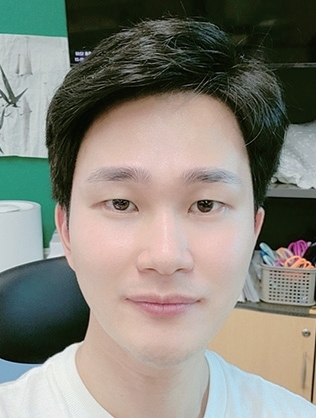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연식이 꽤 된다. 30년 가까이 되었으니 신도시가 시작되면서부터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그때가 도시가 갓 태어났을 때니 우리 지역의 공립교육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때 싹을 틔운 셈이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영속적인 활동이지만 집 주변 공원이나 골목골목 숨어있던 공간들이, 색색의 꽃들이 짙은 녹음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을 바라보면 새삼 시간의 변화라는 것이, 공간의 변화라는 것이 참 놀랍다. 더불어 짧아진 셔츠 차림에 가팔라진 사람들의 호흡과 굵어진 땀방울까지 보면 변화라는 것을 이렇듯 의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요즘은 문득 자연의 변화만큼 학교도 변화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왕왕 있다. 30년이 넘는,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 지역의 공교육은 어떻게 탈바꿈해왔을까.
시작은 그저껜가. 동료와 신규 혁신학교 지정에 관해 얘기 할 때였다. 혁신학교 추진 과정에서 학급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고민을 얘기하는 동료에게 반대로 사람 없고 인기 없는 소위 구도심 변두리 학교들도 걸리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었다. 관내에서 오려고 하는 교사가 없는,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2년 채우고 도망치듯 떠난다는 것을 아는 그런 학교들 말이다. 2년이면 다른 학교로 떠나고 싶어 하는 동료들을 붙잡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학교들일수록 혁신학교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에는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
■ 지금은 혁신학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되새겨볼 때
나는 운 좋게도 혁신학교 운동이 막 태동했을 시기에 교사가 되었다. 옆 학교 선배는 맨날 체육 시간 운동장에 나가서 늘어질 대로 늘어진 런닝셔츠가 온통 땀으로 젖을 때까지 아이들과 놀고 수업했다. 후배 교사만 공개 수업하는 학교 관행을 바꾸려고 경력 이삼십년 교사들이 먼저 공개수업을 하고 얼마든지 교실을 내어 보였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냥 그 학교의 분위기가 부러웠고 선배들의 열정에 부끄럽던 시기가 있었다. 다만 마냥 예전을 미화하고 싶지는 않다. 적절한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교사 일부의 개인기나 열정에만 의존했던 혁신학교 운동은 지금은 제도권 교육의 일부로 석화(石化)된지 오래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보고와 감사라는 관료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학교는 상위 기관에 종속되고 교직 문화도 거기에 따라간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몇 줄의 문장에 긴장해야 하는 교직 문화가 학교 내부에서 갑자기 민주적으로 될 리가 없다. 더불어 혁신학교 운동을 주도했던 선배들도 결국은 관리자의 길을 가고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쳐서 포기하는 모습들을 여럿 보게 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초심전심(初心全心)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이제는 개인의 열정과 도그마에 의존했던 시간은 지나간 대로 의미를 두었으면 한다. 나는 혁신학교 운동을 주도했던 선배들을 존경한다. 모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아이들 발 다칠까봐 돌 몇 개씩은 꼭 주워서 퇴근하던 나이 든, 지금은 은퇴하신지 꽤 된 선배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득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가 이제는 함께 가야 한다. 학교가 자생하지 못하게 되고 혁신학교를 한계에 가두었던 여러 가지 답답함에서 이제는 학교를 좀 놓아주자. 학교 혁신을 하고 싶어도 2년 만에 교사들이 떠나가는 학교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이 당최 될 리가 없다. 같은 지역의 인기 학교들과 동일한 근무년수가 매겨지는 마당에 어차피 9년 근무하는 것이 한계라면 교사들은 기왕이면 집 가깝고 큰 학교에 근무하고 싶어 한다. 이럴 때는 낙후된 우리 지역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교사들에게 줘야 한다. 지역청 차원에서 지역만기 대상자라도 지속 가능 근무 심사를 통해 가난한 학교, 인기 없는 학교들도 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지역 교사 선발과 마을 교사 정착을 통해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핀란드 교육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핀란드 교육을 가능케 하는 학교 자치 문화와 제도에는 정작 위정자들은 입을 닫는다. 옳은 길일지언정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원이 빗발치는, 경력에 누가 되는 표 떨어지는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럴듯해 보이는 단편적인 수업 몇몇에서 좋은 과실만 따오려는 동도서기(東道西器)식의 태도에는 부아도 나고 힘도 빠질 수밖에 없다.
■ 혁신학교 다음의 교육으로서 미래학교
사실 굳이 교육을 예전의 교육과 다음의 교육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 교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하듯 한 길로 변화하며 이어져 왔다.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진보의 길을 걸어왔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세웠다. 선배들은 헌신했고 후배들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고 교육을 보는 시야를 키웠다. 혁신학교 운동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근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전환기적인 시기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은 결국은 교육밖에 없지 않나. 듀이가 말했듯 민주주의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스스로를 다스림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미래학교도 결국 자치 문화와 제도에 뿌리를 둬야 할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열정과 희망을 보여줬다면 미래학교는 제도와 문화로서 지속 가능한 공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제야 봄이 지났다. 그리고 미래학교는 어느덧 우리 곁에 있다. 천천히, 그러나 아주 가까이. 이창건 성남 상대원초 교사
이창건 성남 상대원초 교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