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약 관리 엉망, 선거법 바꿔 개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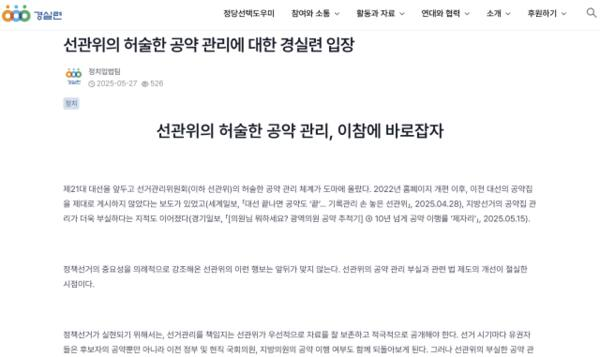
이런 대선은 없었다. ‘지각 공약집’ 얘기다.
선거 공약이 조각조각 제시되고 있다. 드라마 ‘쪽대본’을 보는 듯하다. 찾아보려면 일일이 언론을 들춰야 한다. 진작 배포됐어야 할 공약집이 없어서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오늘 시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약집은 26일 공개됐다. 그나마 책자 발간은 더 늦었다. 민주당은 더 심하다. 28일 오후에 공개했다. 사전투표를 반나절 앞두고 나온 것이다. ‘탄핵 대선’의 촉박함만 탓할 것도 아니다.
돌아보면 대선에서 공약은 늘 경시됐다. 선거 공약을 관리·공개하는 곳이 선관위다.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다.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이고 엉망이다. 경실련이 1987년 이후 대선 공약서 공개를 살폈다. 76명의 후보 중 32명은 벽보만 공개하고 있다. 2명은 공보만, 1명은 공약서만 공개했다. 공약 자료가 온전히 공개된 후보는 17명에 불과하다. 백년대계 국가 경영 약속이다. 그 자료가 이렇다.
대선 공약이 이 정도면 지방선거는 어떻겠나.
때마침 본보가 그 실태를 추적해 보도하고 있다. 기획 시리즈 ‘의원님 뭐하세요-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다. 지역 맞춤형 공약의 현재 이행률을 봤다. 23.6%였다. 2013년 조사했을 때는 21%였다. 나아진 게 거의 없다. 그나마 경기도의회는 나은 편이다. 공개된 공약이 꽤나 많다. 다른 광역의회는 공개 자체가 없다. 이행 여부를 대조할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저마다 지역맞춤형 공약이라며 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본 문제는 법률에 있다. 공약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 제7항이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그 임기 만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문구만 그럴듯하다. 여기에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 강제규정이 아니다. 임의규정이다. 후보자가 공개 않겠다고 버티면 그걸로 끝이다.
경실련도 문제를 지적했다. 법 개정 요구다.
‘공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는 일상이다. 아주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약 공개는 실현될 수 있다. 이걸 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풀어놨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시대에 안 맞고 유권자 요구에도 반한다. 이번에는 동기까지 부여됐다. 공약집 없는 대선을 국민이 비난하고, 경기일보를 통해 허술한 공약 관리가 확인됐고, 경실련이 성명으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모든 유권자가 원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