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과연 고흐는 ‘귀’를 잘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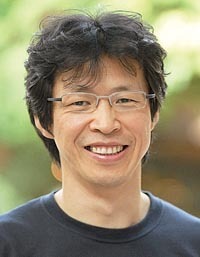
귀를 자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화가 폴 고갱과 다투고 난 뒤 홧김에 잘랐다거나 자주 드나들었던 술집의 창녀 때문에 그랬다거나, ‘화가 공동체’ 건설의 좌절이 원인이었다는 등 설이 분분하다.
이중 세 번째 설은 일본과 관련된 것이어서 흥미롭다. 자신을 일본 수도승으로 묘사할 만큼 ‘일본제 폐인’이었던 고흐는, 이상향인 일본 같은 남프랑스의 자연 속에서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고갱을 불러들일 정도로 이 프로젝트에 열정적이었지만, 고갱과의 불화로 일이 뜻대로 성사되지 않는다. 그로 인한 좌절감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귀 자해 사건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흐의 팬이라면 한번쯤 의문을 가질 법하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고흐가 정말 귀를 잘랐을까?
화가들 기행, 극적일수록 신비감 크나
미리 얘기하자면 고흐는 귀를 자르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고흐가 귀를 자르지 않았다니?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자화상도 있는데, 무슨 망발이냐며 따질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분명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귀를 자른 자화상’ 운운하는 것은 자칫 그릇된 이해를 낳을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보자. 필자가 ‘고흐가 귀를 자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고흐가 왼쪽 귀 전체를 자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단지 귀의 일부, 즉 귀걸이를 하는 귓불만 잘랐을 뿐이다.
귓불을 자른 후에 그린 두 점의 자화상을 보면 붕대를 감은 머리의 귀 부분이 약간 두툼한데, 이는 비록 귓불이 없어졌을지언정 귀의 나머지 부분은 건재함을 알려준다. 고흐는 이 사건 후 자화상을 그리되 왼쪽 귀가 안 보이는 오른쪽 모습을 그렸다.
그렇다면 왜 ‘귀를 자른 자화상’이라고 할까? 먼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작품명이 후대에 붙인 것임을 명심하고 보자. 여기서, 귓불을 잘랐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명을 재구성하면 ‘귓불을 자른 자화상’이 된다. 그런데 작품명이 이렇게 되면 비극적 상황이 주는 극적인 맛이 떨어진다. ‘미치광이 화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리는 그만 거품 빠진 맥주 꼴이 된다. “뭐야, 겨우 귓불만 잘랐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이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혹시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제의 자화상 제목을 한사코 ‘귀를 자른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릇된 정보는 바른 이해 가로막아
화가들의 기행과 관련된 신화도, 결국 당사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감상자를 위한 것이어서, 기행이 극적일수록 작품에는 신비감이 더해진다.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흐의 불행한 개인사는 끔찍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과 열정은 후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고흐한테 귓불이 아닌, 귀를 자른 신화가 필요한 이유는 감동의 극대화 전략에서도 찾아진다.
일반인에게 화가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미치광이 화가’니 ‘천재화가’니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갖가지 기행과 더불어 작품을 감상한다. 화가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정보는 작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로막을 수 있다. 화가는 분명 남다른 눈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때로는 부정확한 단어와 과한 이미지 메이킹이 진실을 오독하게 만든다.
정민영 출판사 아트북스 대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