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도시재생에 대한 오해, 그리고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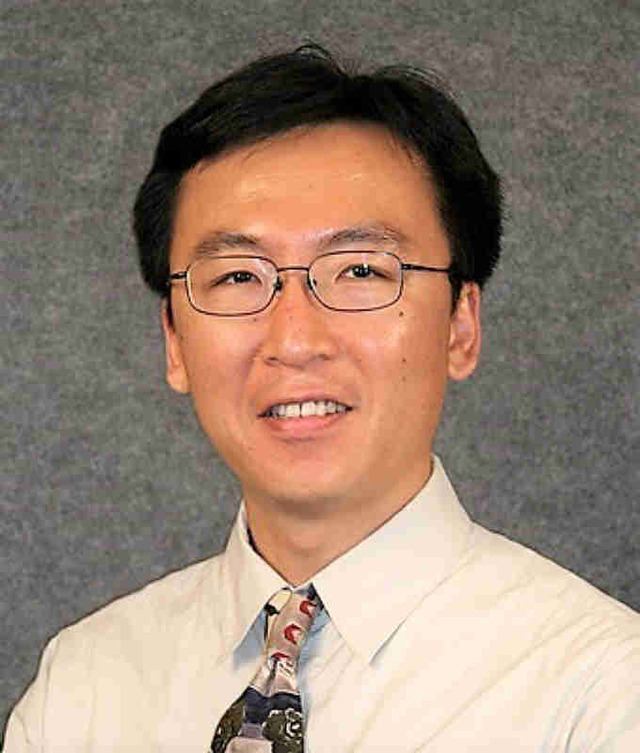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산업화가 꽤 오랫동안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산업화라는 것은 국가 주도로 추진하기 전에는 가내수공업이 조금 발전한 수준이었고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면서 제조업이라는 얼개가 조금씩 만들어졌다. 60년대 초반에 대구, 구로공단 등이 최초로 생겨났고 서울 주변에서는 초창기의 산업단지였던 인천의 부평 주안 산업단지가 60년대 말에 계획되어 70년대부터 입주하였으니 불과 50년도 되지 않았다.
이 산업단지들은 4~50년이 흐르면서 산업의 변화, 건물의 낙후 등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가 조금씩 찾아왔다.
구로공단은 가산디지털단지 등 멋진 변신을 이루었으나 다른 모든 산업단지들이 근사한 변화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이렇게 공장을 허물고 초대형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를 따르지 못한 채 폐허로 변한 곳도 많다.
건축물은 30년 정도 지나면 외관부터 남루해지고 사용성이 떨어진다. 일부 건물은 철거를 고려하고 일부는 고쳐 쓰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결정사항은 당연히 경제성이다.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2010년대에 들어서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산업화가 시작되고 50여년이 지난 시점이다. 건물들이 낙후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초창기 낙후된 건물은 당연히 철거를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것이 경제성 면에서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철거하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는데 환경문제가 불거지고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고 주변환경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대두하면서였다.
철거공사 시 민원이 걱정되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지고, 지진에 대한 걱정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고, 화재를 대비해 내화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길거리의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점점 더 확보해야 했다.
이를 다 고려해서 계획해보니 공사비 등 사업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오고, 작은 건물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1층 면적은 주차장 확보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도시재생이 대세가 되었다. 창건시기가 조선시대 정도는 되어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던 감성은 이제 철거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도시재생은 모든 걸 보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철저하게 경제성에 발을 디디고 미학이라는 눈을 크게 뜨고 불편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성과를 낼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어려운 일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성숙이라는 의미와 협력이라는 힘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이 사회에 있길 바라며, 여러 해 동안 다듬어져 온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심세보 디플레이스 대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