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읽어주는 남자] 사칭
꽃·바람·나무… 어울려 살기 위한 사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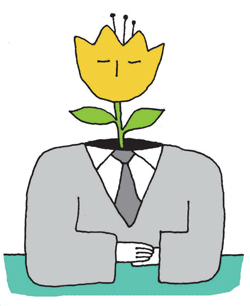
-김왕노
나는 사람과 어울리려 사람을 사칭하였고
나는 꽃과 어울리려 꽃을 사칭하였고
나는 바람처럼 살려고 바람을 사칭하였고
나는 늘 사철나무 같은 청춘이라며 사철나무를 사칭하였고
차라리 죽음을 사칭하여야 마땅할
그러나 내일이 오면 나는 그 무엇을 또 사칭해야 한다
슬프지만 버릴 수 없는 삶의 이 빤한 방법 앞에 머리 조아리며
<슬픔도 진화한다>, 천년의시작, 2002
“사칭은 논리적인 선택이다.” 이게 무슨 멍멍이 풀 뜯는 소리냐고 단박에 반문할법하다. 신분이나 지위를 속여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칭 행위는 누가 뭐래도 범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시대의 사기꾼>이라는 책을 쓴 사라 버튼(Sarah Burton)의 생각은 다른듯하다. 사칭은 ‘범죄’라는 보편의 단정(斷定)에 쉼표를 찍어 숨겨진 내막을 설명한다.
그녀가 변론(?)하려는 대상은 금전적 이득 이외의 것을 취하는 ‘창조적이고 지적인 사칭자’들이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기에 자신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현실의 구조적 모순이 개인의 능력을 매몰시킬 때,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 사칭을 하는 것은 ‘다른 삶으로의 변신’을 위한 개인의 ‘논리적 선택’이라는 그녀의 설명에 반쯤은 공감이 간다.
그렇다고 사칭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실패와 낙오를 만회할 수 없게 만드는 냉혹한 우리의 현실이 ‘창조적이고 지적인 사칭’이라는,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괴(?)하게 여겨지는 변론의 수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김왕노 시인의 ‘사칭’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 시인이야말로 ‘창조적이고 지적인 사칭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꽃과 ‘어울리려고’ 꽃을 사칭하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는 없다. 바람을 사칭하고, 사철나무를 사칭하는 것도 그렇다.
꽃이 될 수 없고, 바람이 될 수 없고, 사철나무가 될 수 없기에 사칭이라도 해보려는 시인의 마음이 참 애틋하고 간절해 보인다. 그 지극함은 강직한 자기성찰의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어울리려 사람을 사칭했다는 화자의 고백은 자연을 사칭했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감정으로 다가온다. 시 ‘사칭>’이 인간의 삶에 필연처럼 드리운 깊은 페이소스(Pathos)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어울리기 위해, 어울려 ‘살아내기’ 위해 가면을 써야하는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의 비애처럼 말이다. 그 순간들이 ‘죽음을 사칭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다가오지만 ‘그 무엇을 또 사칭해야’만 하는 ‘내일’의 시간들, 즉 살아내야 하는 생존의 질긴 ‘당위’(當爲)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보다 삶을 사칭하게 만든다는 시인의 비애가 가슴을 저리게 한다. “슬프지만 버릴 수 없는 이 빤한 방법”이라는 삶의 난제를 ‘사칭’이라는 반어(反語)를 통해 설명해내는 시인의 모습이 애잔하면서도 견고하게 보인다.
꽃을 사칭하는 미적(美的) 행위로 피곤의 일상들을 가뿐히 뛰어넘는 것, 그것이 시인을 ‘창조적이고 지적인 사칭자’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진달래, 개나리, 민들레, 영산홍들이 만화방창하는 봄날의 한 복판에서, 꽃을 사칭하고 바람을 사칭하고 나무를 사칭하며 이 ‘빤한’ 세상의 해괴한 ‘방법’들을 사정없이 뒤흔들어봐야겠다.
신종호 시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