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읽어주는 남자] 팽이
승인
2018-10-16 19:33
시련·역경 이겨내고 도전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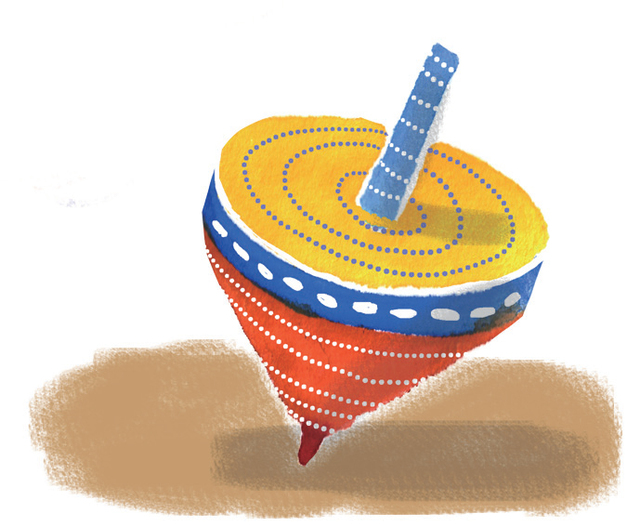
- 이진
채찍으로 때려다오
돌고 돌아야만 설 수 있는 세상
나는 돌고 싶다
잠시라도 멈추면
바닥으로 나동그라질 뿐
성질 사나운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맞으면 맞을수록 아프게 각인되는 속도의 미덕
흙바닥이거나
시멘트 바닥이거나
빙판이거나
시린 발목을 박아놓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꼿꼿이 서 있고 싶다
녹슬고 싶지 않은 생이므로
《손바닥 위에 지구별을 올려놓고》, 시인동네, 2018.
폴란드계 러시아의 발레리노 바츨라프 니진스키(Vaslav Nizinskii)는 지상을 박차고 뛰어올라 공중에 가장 오래 체류한 전설적인 무용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인간 새’라 부르기도 한다. 새처럼 날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은 자유를 향한 도약의 의지일 것이다. 그러나 중력(重力)의 법칙이 비상의 꿈을 땅으로 다시 끌어내린다.
니진스키의 춤이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떨어짐의 운명을 예감하면서도 끊임없이 날아오르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중력은 물리적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향한 의지를 꽁꽁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제약이나 장치도 중력의 일종이다. 니체가 “악마는 중력의 영(靈)이 아니던가”라고 말한 것은 중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개탄일 것이다.
중력을 견디는 현실적 방법은 ‘균형 잡기’에 있다. 빙글빙글 도는 팽이는 자신의 중심축으로 중력의 주저앉힘에 저항한다. 이진 시인의 <팽이>는 견딤과 저항의 회전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팽이’를 소재로 “녹슬고 싶지 않은 생”의 한 국면을 드러낸다. 팽이의 회전은 곧 춤이다. 돌지 않는 팽이는 활동성을 상실한 무의미한 삶을 표상한다. 돈다는 것, 춤을 준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적극적 증거다. 살기 위해서는 “성질 사나운 주인”이 휘두르는 ‘채찍’을 감내해야 한다.
삶에 있어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드물다. 팽이를 돌게 하는 ‘채찍’은 춤의 동력이다. 그래서 시인은 “맞으면 맞을수록 아프게 각인되는 속도”를 하나의 ‘미덕’으로 인식한다. 억압이 있으므로 자유에의 의지가 발현되는 것이다. 그 어느 험한 곳에 있더라도 “시린 발목을 박아놓고” 빙글빙글 도는 팽이의 ‘꼿꼿한’ 자세는 ‘자유의 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녹슬고 싶지 않은 생”이란 현실에 발을 딛고 중력을 거스르며 ‘회전의 춤’으로 자신만의 자유를 구가하는 ‘경쾌한 도발’이 아닐까?
“나는 돌고 싶다”는 시인의 염원은 절박해 보인다. 그 절박은 “∼때문에”라는 이유로 유예되고 좌절된 우리의 꿈들을 떠올리게 한다. “춤을 멈추지 마라, 사랑스런 소녀들이여! 그대들을 찾아온 이 사람은 사악한 눈길을 번뜩이며 놀이를 망치는 자도 소녀들의 적도 아니다”라는 차라투스트라의 외침이 이마에 선뜻 와 닿는 11월. 삶이여, 녹슬지 않는 춤을 추자.
신종호 시인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