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읽어주는 남자] 가난의 저 솔깃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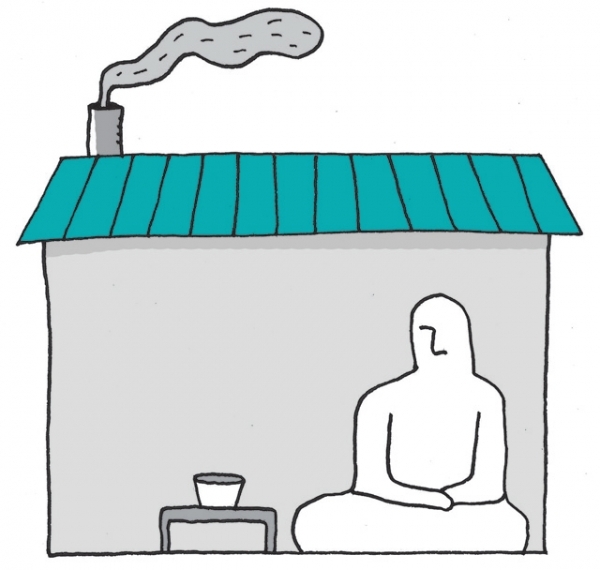
가난의 저 솔깃함
- 정우영
황사가 자욱이 깔리는
새해 아침,
조촐한 시야 밖으로
북소리 퍼진다.
소년은 간데없고
단출한 시구詩句만 남아서
작은 북 울린다.
따뜻하다.
가난을 넘어온 저 솔깃함.
올겨울은 외롭지 않겠다.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
어찌 따로 있을까.
설운 푸념도 기꺼이 꺼내 읽겠다.
낡은 바흐에 귀 기울이다
들여다보는 허름한 생의 등성이.
천진한 음표가 움트고 있다.
*김종삼의 시 ‘북 치는 소년’ 첫 행에서 가져옴.
《활에 기대다》, 반걸음, 2018.
2019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바람처럼 훅 지났다. 삶의 여정을 산행에 비유하자면, 오르는 길은 청춘의 시간이고 내려가는 길은 청춘 이후의 시간일 것이다. 그래서 젊음의 시간은 더디고 힘들며 중년의 시간은 빠르고 하염없다. 물리적 시간은 일정하고 차갑게 흐르지만 마음의 시간은 들쭉날쭉 뜨겁게 움직인다. 모가 난 돌이 구르고 굴러 동글동글한 자갈돌이 되듯 사람 사이에 기대어 부딪히고 깨지다보면 바다에 다다른 강물의 넉넉함처럼 솔깃한 것에 기대게 된다. 솔깃함이란 그럴듯해 보여 마음이 쏠리는 데가 있음을 뜻한다. 천지사방으로 좌충우돌하던 젊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발쯤 앞에 서서 호젓하게 나를 부르는 타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만한 나이가 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세상을 새롭게 살게 된다. 정우영 시인의 시 ‘가난의 저 솔깃함’은 그런 홀가분한 마음이 들게 한다.
홀가분해진다는 것은 많은 짐을 져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이가 어찌 “설운 푸념도 기꺼이 꺼내” 읽을 수 있겠는가. ‘기꺼이’의 넉넉한 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픔과 열정과 혹독의 시간을 건너왔을 것이다. 그 시간의 흐름을 시인은 “소년은 간데없고”라는 표현에 담아낸다. 소년의 뜨거웠던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 “단출한 시구”만 남아 따뜻하게 ‘작은 북’을 울리는 시간, 그것이 “가난의 저 솔깃함”일 것이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가난은 물질적 궁핍이 아니라 조촐하고, 따뜻하고, 외롭지 않은 마음의 아름다움일 것이며, ‘기꺼이’로 모든 푸념과 허름함을 품어낼 수 있는 완숙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얻게 되는 ‘청빈(淸貧)’일 것이다. 그런 마음이 되면 굳이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수사에 따로 매이지 않아도 스스로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노래할 ‘천진한 음표’가 움트고 있는 정우영 시인의 새해가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지 내심 솔깃해진다. 산의 풍경은 오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내려갈 때는 잘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이다.
신종호 시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