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전직(轉職)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전직(轉職)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행위다. 근로자가 어느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그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비롯해 그 회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한다면, 원래 근무하던 회사로서는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그와 같은 전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는 것일까?
모름지기 우리의 법률생활에 있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 중의 하나로 돼 있다. 전직금지약정도 계약의 하나고,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별 근로자는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채용단계에서 사업자측이 위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을 조건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근로자로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근로자가 막상 취업해 업계의 사정을 상세히 알게 되면,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사정과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 등을 근거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다.
헌법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 기본권의 원리가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실현되는 것은 사법상의 법원리나 민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을 근거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보장규정의 정신을 민법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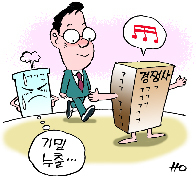
그리고 이와 같은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예컨대 영구적인 전직 제한이나 경쟁업종이 아닌 직종에 대한 전직제한 등은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다.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